
권력이 묻고 이미지가 답하다
이은기 지음
아트북스 발행ㆍ320쪽ㆍ1만8,000원
“짐이 곧 국가다.” 절대왕정의 대명사 루이 14세(1638~1715)가 남겼다는 이 유명한 말. ‘나는 가수다’라거나 ‘내가 조선의 국모다’라는 말은 감히 명함도 못 내밀, 자기 자신을 국가로 치환하는 패기 앞에서 그 말을 실제로 루이 14세가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논란은 중요치 않다. 핵심은 그가 지금은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권력을 누렸다는 것이다.
패기는 좀 떨어지지만 당시 루이 14세의 위상을 짐작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둘째 가라면 서러울 그림도 있다. 1,000여 점에 이르는 루이 14세의 초상화 중 이아생트 리고의 그림은 얼굴은 아주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처진 눈과 볼, 코 옆의 팔자주름과 이빨이 빠져 앙 다문 입술까지 적나라하게 묘사됐다. ‘뽀샵’ 따윈 없는 정직함에 화가 날 법도 한데 루이 14세는 의외로 화가 리고에게 귀족의 작위를 줄 정도로 그림에 만족했다. 세기말 미스코리아를 연상케 하는 풍성한 머리와 흰색 타이즈와 붉은 구두를 착용한 가녀린 다리는, 홍역을 앓아 머리가 빠진 데다 말년에는 통풍 때문에 제대로 걷지도 못했던 그에게 아주 완벽한 왜곡이었다. 실제 얼굴을 본떠 그림에 왕의 위상을 불어넣으면서도 동시에 왕이 감추고 싶은 부분은 슬쩍 덮어준 리고의 그림은 중후함과 관능미로 ‘이미지 메이킹’된 루이 14세를 후세에 길이길이 전하고 있다.
서양미술사학회장과 한국미술사교육학회장을 지낸 이은기 목원대 교수는 ‘권력이 묻고 이미지가 답하다’에서 권력과 미술의 아슬아슬한 관계를 파헤친다. 흔히 우리는 “우피치 미술관에서는 교황의 초상을 보며 라파엘로의 천재성에 감탄”하고 “교회 안에 그려진 벽화를 보면서도 화가의 예술성을 찾”지만 저자는 그 작품이 제작된 시대엔 “‘예술’이라는 개념이 없었다”고 단언한다. “필요에 의해 주문 제작된 이미지들”이니 눈 반짝이며 찾아 헤매는 작가정신이나 예술혼 따위를 갖고 있으면 다행, 없어도 그만이다. 예술가들의 제1 목적은 주문자의 의도를 충실히 구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저자는 예술도 호락호락하게 당하지만은 않았노라며 우릴 안심시킨다. 스페인 화가 프란시스코 고야(1746~1828)의 ‘1808년 5월 3일의 학살’은 스페인의 역사적 사건을 다뤘지만 “사건에 대한 고야의 분노”를 전달하는 측면이 더 강하다. 피살되는 양민 무리와 총기를 든 군인 무리 사이에 놓인 램프로 인해 부자연스럽게 대비된 화면 양쪽의 명암, 뒷모습만 보이는 군인 무리와 달리 두 팔을 벌린 채 총기에 의연하게 맞서는 양민은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처형하는 인간의 동물적 폭력을 고발”한다. 절규하거나 횃불을 든 여인 등을 분절해 표현한 피카소(1881~1973)의 ‘게르니카’에 대해서 저자는 “훌륭한 예술이 동시에 사회정의에도 충실할 수 있음을 내게 확인시켜준 첫 번째 증거품”이라 극찬하기도 한다.
미술을 통해 무언가 말하고자 했던 권력의 욕망만큼 미술 역시 강력한 메시지를 그 안에 품으며 권력을 가졌다. 권력이 미술을 이용하고 미술이 권력을 취하는 ‘밀당’에서 사실은 하나다. 이미지는 권력이다. 이미지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지금 어떤 이미지에 속고 어떤 이미지로 속이고 있을까.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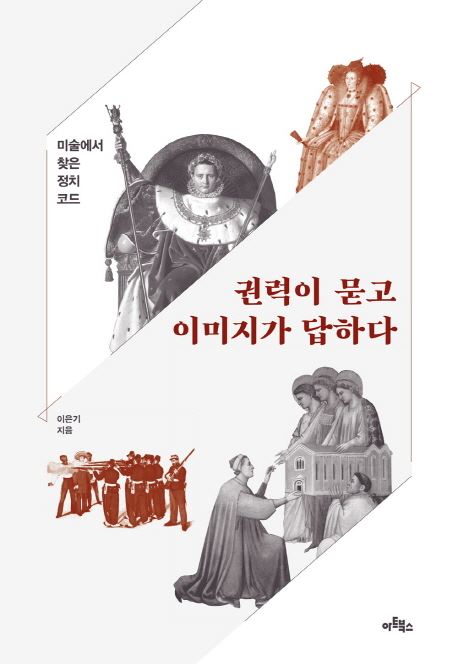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