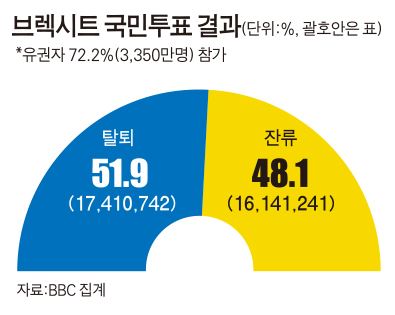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로 수도인 런던의 글로벌 금융허브(Hub) 입지가 뿌리째 흔들릴 거란 전망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 런던의 금융중심지 ‘더 시티(The City of London)’가 공동화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온다.
런던의 특별행정구역인 더 시티는 국제 금융 중심지 자리를 두고 미국 월스트리트와 자웅을 견줘오며 영국 경제의 심장 역할을 해왔다. 금융회사만 5,300여곳, 금융계 종사자만 36만여명에 달한다. 이곳에서 하루에 거래되는 외환은 EU 전체의 78%에 달하는 2조 달러이고, EU 내 헤지펀드 거래의 85%가 런던에서 이뤄진다.
영국이 이렇게 금융 허브로서 입지를 굳건히 지켜올 수 있었던 데는 EU라는 든든한 뒷배경의 힘이 컸다. 26일 국제금융센터와 LG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EU 금융시장 기본법(MiFID)은 EU 내 어느 한 국가의 감독기관에서 설립인가와 감독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회원국에 지점을 개설할 때 해당국 기관의 추가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동일인 원칙’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많은 유럽 금융회사들이 금융 규제가 약한 런던으로 몰려 든 것도 이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브렉시트 후엔 영국 내 금융기관들이 동일인 원칙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금융사들이 줄줄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인력 엑소더스는 벌써 현실화할 조짐이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25일(현지시간) 미국계 대형 투자은행들이 영국 내 일부 업무를 EU 다른 도시로 옮기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 역시 “브렉시트 여파로 최대 4만명이 런던을 빠져나갈 수 있다. 이중 대부분은 미국계 대형 은행 직원들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실제 브렉시트 투표 전 모건스탠리는 브렉시트 가결 시 런던에 있는 전체 직원 5,000명 중 1,000명의 직원을 이동시킬 것이라고 밝혔고, JP모건체이스도 유럽에서 4,000명을 전출시킬 수 있다고 예고했다.
미국계 만이 아니라 유럽계 금융회사들도 런던에서의 인력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다. 런던에 직원 1만2,000명을 두고 있는 도이체방크는 “적절한 직원 이동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고, 심지어 영국계인 HSBC조차 투자은행 부문에서 1,000명(전체의 20%)을 프랑스 파리로 이동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지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현재 더 씨티 지역에만 약 8만여명의 EU 국적 소지자가 활동 중인데 이들은 앞으로 EU 내에서 누릴 수 있던 복지 혜택을 받기 어려워 다른 역내 금융허브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제컨설팅업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는 “브렉시트로 2020년까지 최대 10만개의 금융업계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영국의 금융허브 지위가 어디로 이동할지를 두고는 여러 의견들이 나온다. FT는 아일랜드 더블린, 프랑스 파리, 독일 프랑크푸르트 등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고, 세계 최대의 재보험사인 뮌헨리는 “런던은 금융센터의 영향력을 뉴욕, 싱가포르 등 다른 허브에 내주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