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론자의 시대
피터 왓슨 지음ㆍ정지인 옮김
책과함께 발행ㆍ832쪽ㆍ3만8,000원
신은 존재하는가? 신 따윈 없다고 열정적으로 싸워대는 전사들은 넘쳐난다. 논리적, 진보적이라는 이들일수록 무신론을 자격증 내지 훈장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 비록 그 어법이 묘하게도 ‘종교라는 악의 구렁텅이에서 너희들을 구원하리라’는 종교적 어법이긴 하지만 말이다. 리처드 도킨스ㆍ크리스토퍼 히친스 같은 전투적 무신론자들이 비웃음 당하는 까닭이다. 실제로도 ‘이성적인 사람=무신론자’라는 추론은 착각에 가깝다.
몇몇 연구자들 주장만 일별해봐도 그렇다. 저명한 영장류학자 프란스 드 발은 도킨스류의 무신론에 무척 짜증낸다. 그는 ‘착한 인류’(미지북스)에서 “증명할 수도, 반증할 수도 없는 존재에 대해 그토록 안달복달해봤자 얻는 게 뭔가”라면서 “신이 존재하는가 아닌가 하는 물음은 지루하기 짝이 없는 문제”라며 논쟁 자체를 아예 저 멀리 내던져버린다. 일본의 인류학자 나카자와 신이치는 ‘신의 발명’(동아시아)에서 신을 가리켜 “현생 인류 뇌에 일어난 혁명적인 뉴런 조직의 변화과정에서 출현한 유동적 지성의 작용”이라 부르면서 그렇기에 “인간이 완전한 무신론의 상태에 있는 것은 원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래서일까. 근대화, 혹은 세속화 이론가 막스 베버의 후예를 자처하는 종교사회학자인 피터 버거조차 ‘어쩌다 사회학자가 되어’(책세상)에서 “근대는 무신론의 시대라 생각했는데 실제론 다신론의 시대”라고 고백할 정도다. 신, 혹은 절대자에 대한 어떤 감각 같은 건 인간 존재의 조건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얘기다.
‘책과함께’가 내놓은 ‘무신론자의 시대’는 이 모든 얘기들을 집대성한 책이다. ‘집대성’이란 표현은 832쪽에 달하는 두께뿐 아니라 피터 왓슨이라는 저자 이름에게도 해당된다. ‘생각의 역사’(들녘), ‘저먼 지니어스’(글항아리)처럼 1,000쪽을 훌쩍 넘기는 책을 예사로 써내는 지성사가다. 이 책에서도 역시나 철학, 과학, 사회학, 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슈퍼스타 지식인들을 일일이 다 불러내서 이리저리 재고 품평해댄다.
‘무신론자의 시대’가 제목이라 해서 ‘신 없이도 우린 잘 살 수 있다’는 선언문이라 단정할 필요는 없다. ‘근대 이성의 수호성인’을 자처하는 독일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가 쓴, 이성만으로 채울 수 없는 어떤 허전함 같은 걸 토로한 ‘결여된 것에 대한 의식’이란 글이 이 책의 출발점이다. 종착점은? 역시나 하버마스가 제시한 바 ‘연대’ 혹은 ‘좀 더 포용적인 공동체’다.
우린 늘 삶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되묻는 존재다. 그 준거는 우리 인간 공동체다. 인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무신론자인데 유신론자보다 더 독실하게, 유신론자인데 무신론자보다 더 관용적으로 살아버리면 된다. 신의 은총 덕이냐, 생물학적 진화의 결과냐는 중요치 않다. 그렇게 살아버릴 각오 없이 신이 있네 없네 열정적으로 떠들어대는 건 괜한 입씨름일 뿐이다. 편갈라 싸움하는데 골목대장 노릇 하는 재미야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태성 기자 amorfati@hankookilb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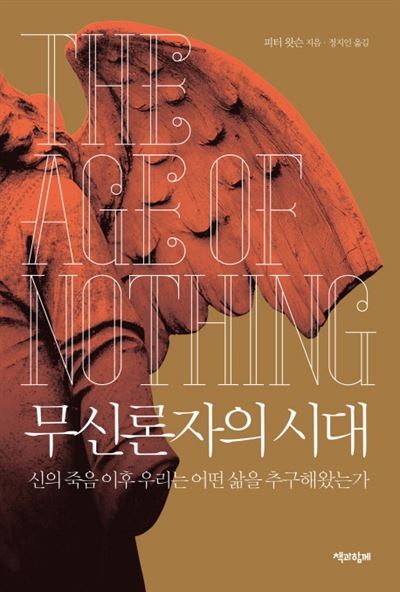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