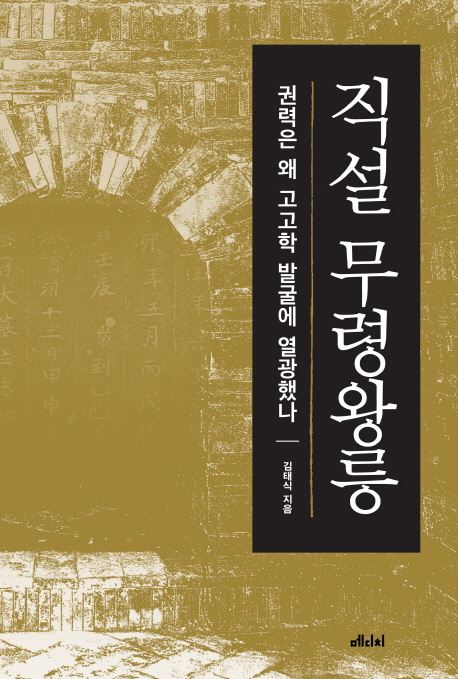
직설 무령왕릉: 권력은 왜 고고학 발굴에 열광했나
김태식 지음
메디치미디어 발행ㆍ480쪽ㆍ2만2,000원
백제 역사 그대로 간직한 왕릉
유물 3000점 40시간 만에 발굴
같은 해 경주 유적 복원ㆍ정비도
국민에 ‘위대한 왕’ 무의식 심어
독재자 정당화하는 치밀한 계획
수학여행 하면 떠오르는 장소들이 몇 있는데 무령왕릉도 그 중 하나다. 한때는 고분 내부 투어가 가능해 줄지어 구경했다. 가이드가 해주는 설명은 대체로 1,500년 백제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고분과 유물의 위대함과 아름다움 정도로 귀결됐다.
그러나 무령왕릉의 발굴은 너무나도 졸속이었다. 3,000여 점의 유물이 발굴 시작 40시간 만에 끝났다. 무령왕의 무덤인지 모르고 무덤 앞쪽에 구덩이를 판 1971년 7월 7일 오후 4시를 시작점으로 잡았을 때 그렇다. 무령왕릉이라는 사실을 알고 발굴단이 투입됐을 때로 따지면 12시간, 첫 유물인 청자가 발견된 때부터 따지면 8시간 만에 모든 발굴 작업이 마무리됐다. 그것도 한밤중에.
도굴처럼 작업된 무령왕릉 발굴을 두고 저자는 “지상 최악의 졸속적 발굴”이라고 말한다. “고고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가슴 떨린다”더니 하루 만에 모든 작업을 끝내고 “후련하다”며 공주를 홀연히 떠나버린 발굴단에 저자는 통탄했다. 물론 발굴 장면을 보겠다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현장에 몰려왔고 “빨리 꺼내라”며 지휘도 서슴지 않았다니 발굴단에게도 나름의 변명거리는 있다. 그렇다고 “예기치 않던 상태와 흥분 속에서 머리가 돌아버린”채로 진행한 발굴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김태식은 17년을 문화재 전문기자로 살았다. 그 기자로서의 경험과 감각을 한껏 발휘해 이 책에서 ‘공개적으로’진행됐던 무령왕릉 발굴현장을 긴장감 있게 묘사한다. 발굴단과 관계자들이 했던 말들, 후에 회고록에 적힌 글들, 관련 언론보도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자료를 긁어 모아 아주 치밀하게 분석하며 그가 발견한 것은 정권과 유물 사이의 교묘한 결탁이다.
무령왕릉이 발굴된 그 해 박정희 정권은 ‘경주관광개발계획단’을 출범한다. 계획은 경주 일대 유적의 정비와 복원을 한 축으로 삼았는데 목적은 분명했다. 국민 정서의 순화. 과정은 간단하다. 유물이 모습을 드러낼 때의 신비로움이 사용자였던 왕과 맞물리며 국민에게 ‘위대한 왕’의 이미지를 심는다. 국민들은 무의식적으로 과거의 영광이 다시 한번 재현되길 열망한다. 그리고 독재자의 출현이 정당화된다. “요사이는 너무 유적을 파헤치는 것 같다” “선전하기 위해서 자꾸만 새 유적을 파는 것 같다”는 당시 국립박물관장 김원룡의 의미심장한 말은 “무령왕릉의 최고 발굴품은 민족주체성”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버스에서 어디에 앉을지나 누가 싸온 김밥이 더 훌륭한가와 같은 사사로운 일들이 수학여행에선 더 중요했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 정도 메시지는 뇌리에 남았다. “위대하고 찬란한 우리의 역사.” 아무것도 모르고 낄낄대는 아이들을 제 편으로 만들려는 정권의 치밀한 계획에 넘어갔던 건 아닌가? 참으로 거대한 음모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