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고: 어떻게 무너진 블록을 다시 쌓았나
데이비드 로버트슨, 빌 브린 지음ㆍ김태훈 옮김
해냄출판사ㆍ380쪽ㆍ1만6,800원
‘세기의 장남감’ 꼽힐 만큼 큰 인기
비디오게임ㆍMP3에 밀려 위기 맞아
조립식 액션 피규어ㆍ개발 절차 개방
변함없는 내부 혁신 노력으로 극복
2000년 ‘포춘’지는 레고를 세기의 장난감으로 선정하면서 전 세계에 흩어진 2,000억 개가 넘는 레고 블록에 대해 이렇게 썼다. “적어도 100억 개는 소파 쿠션 밑에 그리고 30억 개는 진공청소기 안에 있을 것이다.”
레고는 1932년 덴마크의 작은 시골 마을 빌룬에서 시작됐다. 직사각형 블록 위에 붙은 여덟 개의 돌기와 아래에 붙은 세 개의 빈 원통은, 그 자체로는 플라스틱 조각에 불과하지만 맞붙이는 순간 무한대의 가능성이 열린다. 여섯 개의 블록으로 9억1,500만 개가 넘는 조합을 만들 수 있으며, 더 많이 사용한다면 실제 크기의 롤스로이스 항공기 엔진(블록 15만 2,000개)과 화장실과 샤워기를 갖춘 실제 크기의 이층집(블록 330만개)을 창조할 수 있다.

80여 년이 지난 지금, 레고는 세 살 어린이부터 구글의 창업자까지 한 해 전 세계 7,500만 명이 구매하고 연간 2억 박스 이상 팔리는 세기의 장난감이 됐다. ‘레고: 어떻게 무너진 블록을 다시 쌓았나’는 레고의 탄생과 성장, 그들이 겪은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모든 조직이 직면하는 혁신의 딜레마에 대한 통찰을 제시한다. 저자인 와튼 스쿨의 데이비드 로버트슨 교수는 베일에 싸여 있던 레고 그룹의 심장부를 심층 취재해 ‘레고 교수’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그는 5년 동안 레고 본사를 수 차례 방문하고 CEO인 외르겐 비그 크누스토르프와 창업주의 손자이자 현재 이사회 부회장으로 있는 키엘드 키르크 크리스티안센을 비롯해 고위 경영진, 직원들, 협력 업체를 인터뷰해 레고 그룹의 조직 내부를 생생하게 묘사했다.
1부에서는 레고가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한 후 파산 위기에 몰리게 된 과정을 보여준다. 20세기 말 비디오게임과 MP3 플레이어가 등장하면서, 레고는 다른 모든 아날로그 오락거리와 함께 뒷방 노인 신세가 됐다. 경영진은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컴퓨터 게임, 아동복, 여아용 레고 인형, 책, 놀이공원 등 신규사업을 마구잡이로 확장했으나 결과는 처참한 실패였다. 2004년 회사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당해 적자는 14억 덴마크 크로네(2,615억4,000만원)에 이른다.
2부에서는 생존을 위한 치열한 레고 그룹의 노력과 부활의 과정이 그려진다. 새로운 경영진은 세계 최초로 조립식 액션 피규어를 개발하고 레고 팬들이 온라인에 직접 만든 레고 세트를 올릴 수 있게 하는 등 개발 절차를 외부로 개방했다. 그 결과 레고는 5년이 채 안돼 무너진 블록을 다시 쌓아 올릴 수 있었다. 세계적으로 불경기가 심화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레고 그룹의 세전 이익은 네 배로 늘어 동기간 한 자릿수 성장률에 갇힌 해즈브로, 마텔 등 장난감 산업의 거인들을 크게 앞질렀다.

저자가 주목하는 것은 레고가 자신들의 사업 관행을 깨트리는 게 아니라 그 틀 안에서 경쟁력을 구축해 이런 성과를 냈다는 점이다. 구글처럼 근무환경이 파격적인 것도 아니고, 애플처럼 한 사람의 천재를 가진 것도 아니지만 레고는 80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혁신적이다. 저자는 모든 기업의 고민거리인 혁신에 대해 레고의 사례를 들어 혁신이란 강박에서 놓여나라고 말한다. 중요한 것은 혁신을 위한 혁신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혁신의 틀을 만드는 것. “결국 블록이 맞아떨어지게 하는 일은 우리 각자의 몫이다”
황수현기자 sooh@hankookilb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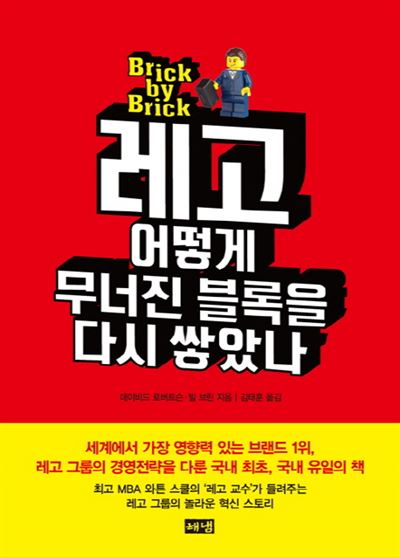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