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여행기는 ☞벨리즈 입국 분투기와 연결된다. 한국과 벨리즈는 2014년 12월 무비자 협정을 체결했다.

입국 절차로 그 곤욕을 치르고도 벨리즈에 복수의 칼날을 들 수 없었던 이유. 벨리즈의 휴양지 키코커(Caye Caulker)가 자꾸 이런 말을 하도록 옆구리를 쿡쿡 찔렀다. “인생 뭐 있니? 천천히 가자. 문제없으니까.”

빅마마의 ‘마빡’에 FBI 요원처럼 벨리즈 입국 비자를 보여주고 돌아선 뒤였다. 분노조절장애마저 보이던 그 시점, 산 페드로를 출발한 마지막 보트는 키코커에 우릴 내려다 주었다. 해변으로 가는데 무슨 큰 목적이 있을 리 없었다. 다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 내버려둘 시간에 목말랐다. 여행을 노동처럼 하는 우리에게는 생각도 싹둑, 행동도 싹둑, 팔자 늘어진 고양이처럼 지낼 시간이 필요했다. 결정적으로 키코커의 슬로건이 우릴 낚았다.
“Go slow”
그래, 격렬히 게을러 주겠어.


오전 8시. 늘어진 바닷가의 기상 시각으론 새벽이다. 호스텔의 총천연색 나무 기둥에 부서지는 햇살이 눈을 자극했다. 철썩철썩 모래를 밀어내는 파도가 세상의 모든 소리였다. 황홀한 카리브해 풍경에 몹시 허기가 졌다. 아침을 잔뜩 먹고 배를 두들기며 한참을 늘어졌다. 아직 오전인데 낮잠에 빠졌다. 해먹에 너무 오래 누어 몸에 벌집 문신도 생겼다. 햇살의 조명을 받아 반짝반짝 빛나는 파도 결에 반해 선착장 옆에 드러눕기도 했다. 아, 이런 원시적인 삶이 얼마 만인가! 배고픈 시각에 맞춰 먹는 것도(먹으면 버스 놓친다), 침대에서 뒹굴고 싶은데 여유를 부리는 것도(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니). 한국에선 일 때문이란 변명으로, 여행 중엔 떠난 자가 짊어져야 할 여러 변수 때문에 해보지 못했던 터였다. 키코커는 Go Slow…. 이곳에 선 자라면 누구나 느리게 살아도 된다는 속도 면죄부를 얻는다. 결심과 계획 따위는 저 바다에 내다 버려! 뭔가를 하려는 의도 자체가 바보 같은 짓이야! 그런 점에서 탕탕의 제의는 대단히 용기 있는 일처럼 느껴졌다.
“뿌리다, 산책이나 할까?”



벨리즈는 방년 36세밖에 되지 않은 젊은 나라다. 지난 1981년 영국령 온두라스에서 독립해 ‘카리브의 보석’으로 불리기까지는, 키코커 섬이 단단히 한몫했다. 키코커는 ‘부재’의 섬이다. 일단 범죄의 부재. 벨리즈 땅을 처음 밟았을 때 우리를 덜덜 떨게 한 것은 ‘범죄 신고’ 광고판이었다. 보상이 있을 거란 달러 표시와 함께 제보 번호가 대문짝만하게 쓰여 있었다. 해외 안전자문위원회(OSAC)에 따르면, 벨리즈의 살인율은 세계 10위 안. 그 불명예의 평균율을 바짝 올리는 벨리즈 시티로부터 워터 택시로 1시간여 거리에 있는 이곳엔 강도도 총도 없다. 복 받았다.
다음으론 소음의 부재. 이곳의 교통 수단으론 도보가 기득권을 갖고 있다. 그 곁을 오직 골프 카트와 자전거만이 바짝 추격한다. 길이 8.2km, 너비 2km에 불과한 섬이기에, 섬의 끝과 끝을 찍는다 해도 3시간이면 충분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현지인이 이곳 경제를 쥐고 있기에, 대형 호텔체인 이 탐낼 법한 모든 편의가 이곳엔 없었다. 소음은 오로지 저 카리브해의 멈추지 않은 파도 소리 뿐.



마지막으로 문제의 부재였다. No shirt, No shoes, NO PROBLEM! 키코커를 정의하는 다른 문장이다. 비키니 차림으로 자전거를 타고 바람처럼 달리는 여인의 등짝을 보는 일이란 흔했다. 어깨만 스쳐도 휘말리는 말다툼도 이곳엔 없었다. 더구나 내겐 거리를 활보하는 개를 흥분시키는 구석이 있는데(종종 개에게 습격을 받는다), 이곳 개는 감각이 무딘지 고개를 45도 방향으로 틀고 카리브 해를 바라보며 유유히 걸었다. 이미 점심 시간이 지나면서 북쪽 끝 더 스플리트(The Split)에 있는 ‘게으른 도마뱀 바(lazy lizard bar)’엔 손님이 달처럼 차오르고 긍정의 물결이 춤췄다. 누가 본인의 술잔을 몰래 가로채 가도 웃었다.

이곳에서 ‘할 일’은 딱 한 가지, 스노클링이었다. 반나절 코스를 택했다. 두근두근했다. 벨리즈 산호초의 폐부 속에서 몸과 바다의 생채리듬을 느끼는 일이었다. 우리의 가이드는 아버지와 아들 부자지간. 필시 BYC 삼각 면 팬티를 착용한 채 초콜릿 복근과 곱게 땋은 머리로 정체성에 혼란을 주던 아버지는 산호를 손상하지 않기를 거듭 당부했다.
[영상] Don’ touch! 라이언 피시의 마지막 고귀한 날갯짓을 보기 전까지 채널 고정!

수심이 깊고 얕기를 거듭하던 카리브해는 그럴듯하게 민낯을 드러냈다. 투명 필름이 된 바다 아래로 큼직한 물고기의 유영이란! 가슴이 쿵쾅거려 그들을 성나게 하는 게 아닐지 조바심이 났다. 먹잇감으로 유인한 적이 추호도 없었는데도 바다는 아예 수족관이라 부르는 게 온당할 정도였다. 키코커가 소라와 바다가재 먹이 창고이자 어류가 회유하는 요지란 증거가 지척이었다. 세상을 구하러 들어가듯 겁 없이 풍덩! 깊이, 더 깊이 들어갔다. 몸집이 커진 메기 같은 순둥이 너스 샤크(nurse shark)를 따라가기도 하고, 가오리의 푸덕거림에 웃다가 평생 마실 바닷물을 다 마셨다. 햇살을 받아 광채가 나는 바닷속은 환희 그 자체였다. 심통 많은 얼굴의 라이언 피시는 건드리면 호흡 곤란이 오는 방어기제가 있다. 그 주변을 유영했다. Go Slow…



해가 어둑해지자 자연스레 북쪽으로 향했다. 더 스플리트였다. 있는 힘껏 강이 된 바다로 내달려 입수했다. 석양 아래 잔잔한 물결에 찰랑찰랑 몸이 흔들거렸다. 바에선 너도 나도 친구가 된 여행자의 수다가 계속되었고, 바 옆으로 카리브해식으로 온천 반신욕을 즐기는 한량도 눈에 띠었다. “Cheers!” 탕탕과 나의 칵테일 잔도 시끄러운 건배가 이어졌다. 내일이 있다는 긍정이 흐르면서도 내일이 없는 것처럼 노는 키코커의 삶이었다. 아직 가시지 않은 추위엔, 누군가에게 스트레스가 될 설 연휴엔, 이런 기억만큼 위로가 되는 것도 없다. 오늘을 버텨낼 어떤 위로가.
여행의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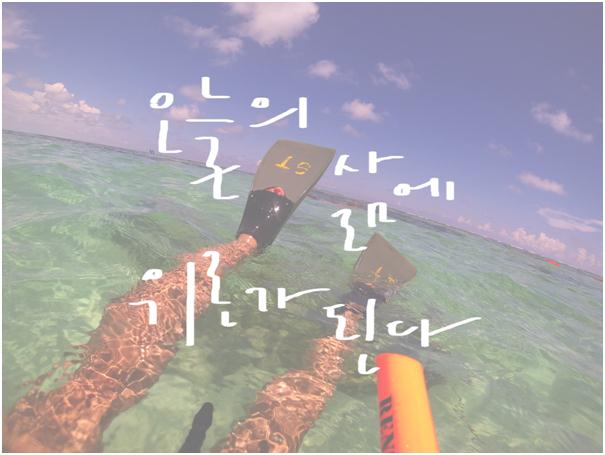
강미승 여행칼럼니스트 frideameetssomeone@gmail.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