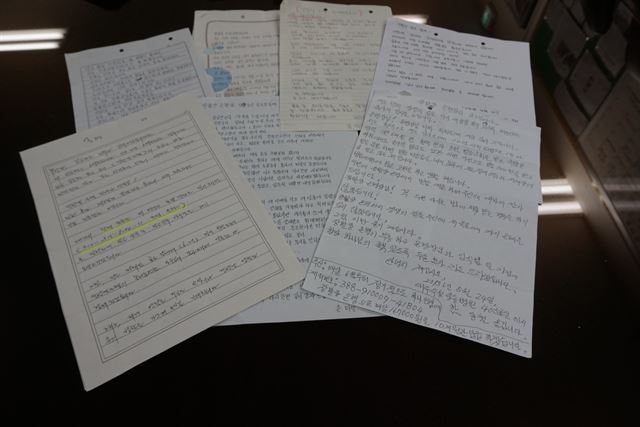
지난해 목과 허리를 갑자기 다쳐 장애 4급 판정을 받고 일자리까지 잃은 이모(47)씨. 파산 신청까지 했던 그에게 악재는 엎친 데 덮쳤다. 통원 치료를 받고 귀가하던 어느 날 처지를 비관하며 홧김에 길가 벽돌을 던진 게 화근이었다. 이씨가 던진 벽돌로 한 주점이 설치해 놓은 높이 2m 원통형 입간판이 찢어졌고 그는 재물손괴 혐의로 체포됐다. 합의를 하지 못해 형사 입건된 그는 결국 벌금 50만원을 내거나 교도소로 가야 할 처지에 놓였다.
당장 벌금 낼 돈도 없어 꼼짝없이 교도소 노역을 해야 했던 그는 한 사회복지사의 소개로 ‘장발장은행’을 알게 돼 희망의 끈을 잡을 수 있었다. 이씨는 자신의 처지를 소명했고 지난달 7일 대출금 50만원을 승인 받을 수 있었다. 그는 “일자리와 건강을 모두 잃은 데다 당장 벌금을 낼 수 없어 노역을 해야 할 처지가 될 뻔 했다”며 “은행 덕분에 노역형을 면하게 돼 다행이고 곧 이 돈을 갚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소액 벌금도 낼 돈이 없어 교도소에 가야 할 처지에 놓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장발장은행이 오는 25일 설립 1주년을 맞는다. 시민단체 인권연대가 벌여온 ‘43199 캠페인’ 연장선상에서 지난해 2월 25일 설립된 은행은 2일 현재 이씨와 같은 사연을 가진 314명에게 5억9,458만원을 대출해줬다. 이 중 10명이 전액 상환했고, 125명이 일부 상환한 금액까지 포함하면 7,896만원이 돌아왔다. ‘43199’는 2009년 기준으로 1년에 벌금형 선고를 받고도 낼 돈이 없어 교도소에 갇힌 사람들의 수다.
순전히 기부금을 통해 운영되는 이 은행은 대출 신청자 사정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대출되고 상환 기간과 액수도 달라진다. 2년 전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 형과 함께 살고 있는 A(44)씨 역시 이 은행 문을 두드렸다. 지난해 사업을 위해 제2금융권 캐피탈 대출을 받았지만 제때 상환하지 못해 금융업체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 당한 A씨는 벌금 70만원을 내야 할 형편에 놓였던 것. 인력시장을 통해 직업을 구하고 있고, 거치 기간이 지난 뒤 3개월 내 상환 계획까지 꼼꼼하게 밝힌 A씨는 은행에서 대출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은행 운영을 맡고 있는 오창익 인권연대 국장은 “신청을 받을 때 신청자는 자신이 돈을 상환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적게 한다”며 “얼마가 걸릴지는 몰라도 그들은 결국 다 갚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대출을 해주진 않는다. 운영자금이 넉넉하지 못한 이유도 있지만 사회 통념상 일정 수준 이상 중죄를 지은 사람에게까지 대출을 해주는 건 은행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오 국장은 “대출은 7명으로 구성된 대출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다”며 “소년소녀가장과 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이 우선 대출 대상이고 성폭행이나 음주운전 같은 범죄는 심사를 통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은행에 따르면 대출 승인을 받은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한부모가정, 장애인이 전체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은행 운영 1년간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일명‘장발장법’이라고 불리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벌금형 역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게 된 것. 하지만 은행 측은 개정안에 일수벌금제(피고인의 재산 상황 등에 따라 1일 벌금액 결정)가 담기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학계에서도 일수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터라 아쉬움이 더 컸다.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프랑스와 독일 등 이미 유럽에선 일수벌금제를 시행하고 있고 국내 학계에서도 수년간 논의를 진행해왔다”며 “소득 조사를 통해 벌금 기준을 마련하면 형평성 문제 등이 불거질 일은 없다”고 말했다.
은행의 궁극적인 목표는 역설적이다. 바로 문을 닫는 것이다. 오 국장은 “억울한 이유로 교도소에 가야 하는 사람들이 사라지면 은행은 자연스레 문을 닫게 될 것”이라며 “문을 닫는 날이 되면 가장 행복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현빈기자 hbkim@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