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 아렌트의 말
한나 아렌트 지음ㆍ윤철희 옮김
마음산책 발행ㆍ208쪽ㆍ1만4,500원
“얘기 하나 할게요. 그의 경찰 조서를 읽어봤어요. 360페이지나 되는 조서를 읽고는 다시 한번 매우 꼼꼼히 읽어봤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낄낄거렸는지 몰라요. 나는 큰소리로 폭소를 터뜨렸어요!”
책 제목 ‘한나 아렌트의 말’ 그대로 책은 한나 아렌트의 날 것 그대로의 육성이 담긴 4편의 인터뷰를 담고 있다. 이 말에 등장하는 ‘그’는 칼 아돌프 아이히만이다. 나치 친위대 중령으로 600만 유대인 학살을 집행한 인물, 종전 뒤 아르헨티나로 도주했다가 끝내 이스라엘 첩보기관에 붙잡혀 재판에 회부됐던 사람, 법정에서 철학자 칸트의 도덕 계율을 들먹이며 자신은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를 다했을 뿐이라 항변했던 인물이다. 마침 지난 27일 홀로코스트 추모일을 맞아 이스라엘 정부는 아이히만이 1962년 5월 29일 작성한 탄원서를 공개했다. 당시 이스라엘 대통령 이츠하크 벤츠비에게 보낸 탄원서에서도 아이히만은 사형집행을 멈춰달라 호소하면서 자신은 하수인에 불과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이틀 뒤 사형은 집행됐다.
널리 알려진 대로 미국 뉴요커지의 취재 의뢰를 받아 1961년 개시된 이 세기의 재판을 지켜본 아렌트는 1963년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라는 책을 내놨다. 거센 논란이 일었다. 비판은 ‘평범함’(일본에서는 ‘진부함’)이라 번역된 ‘Banality’에 쏠렸다. 이 용어는 ‘내 안에 아이히만 있다’로 해석되면서 ‘우리 모두가 아이히만이란 얘기냐’, ‘그래서 아이히만은 죄가 없다는 거냐’는 분노가 줄이었다.
저명한 유대인 역사학자 게르숌 숄렘은 아렌트의 글이 정식 출간 이전 뉴요커에 연재될 때부터 “네가 과연 유대인의 딸이냐?”고 공격했고, 친한 유대인 동료들은 절교를 선언했다. 아우슈비츠 생존자로 지난 역사에 대한 화해와 용서를 말하던 이들에게 “나의 원한을 너희들이 인내하라”고 맞받아쳤던 장 아메리는 1966년 내놓은‘죄와 속죄의 저편’(도서출판 길)에서 아렌트의 주장을 이렇게 평했다. “인류의 적에 대해 들어서만 알 뿐이고 오로지 유리로 된 새장을 통해서만 그를 보았을 뿐이다.” 좀 악의적인 이들은 스승이자 연인이자 친구였던 마르틴 하이데거과의 묘한(?) 관계 때문에 지루하기 짝이 없는 기나긴 하이데거의 주장 가운데 ‘생각 없음’ 개념을 끌어와 불필요하게 확대 적용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나치에 부역한 하이데거의 복권을 도와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돌았다.
그나마 아렌트에게 온화한 시선을 보낸 해석은 ‘재평가’(열린책들)에 실린 영국 역사가 토니 주트의 설명이다. 주트는 여기서 아렌트가 ‘유대인’보다는 ‘독일어를 제1언어로 쓰는 중부유럽의 지식인 계급’에 속했다는 자의식이 너무나 강했다고 평했다. “유대인에 대한 박해가 독일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에 진정으로 대면하지 않았”다는 평이다.
‘한나 아렌트의 말’에서도 아렌트는 자신에게 남은 것은 “모어”(물론 여기서는 독일어)라고 분명히 밝힌다. 온갖 논란 속에서 재판에 회부된 것은 아이히만인데 왜 사형선고는 아렌트까지 같이 받아야 하느냐는 반론도 있었지만 강력한 비난 목소리에 묻혀버렸다.
이 논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독일 학자 베티나 슈탄네트는 명백히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겨냥한 ‘예루살렘 이전의 아이히만’을 2014년 내놨다. 아르헨티나에 숨어살던 시절 아이히만이 남긴 기록, 주변에 있던 나치 추종자들과의 대화 등을 추적해 아이히만은 철저한 반유대주의자로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 명확히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이히만이 재판에서 약간 아둔한 하급 공무원인 것처럼 굴었던 것은 형을 낮추기 위한 법정 전략에 불과했다는 얘기다. 이는 법정전략에 대한 이해 부족-여기엔 여성을 낮춰보는 뉘앙스까지 첨가된다. ‘이성적인 남성’과 ‘감성적인 여성’이라는 오래된 이분법-이 아렌트의 오해를 낳았다는, 오래 지속된 비판의 결정판 격이었다.

아렌트는 정말 몰랐을까. 벌레 같은 유대인들을 지구상에서 싹 쓸어버리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낙이라고 주장하는 머리에 뿔 달린 거대한 악마가 아니라, 왜소한 덩치의 소심해보이는 남자가 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어쩔 수 없었을 뿐이라고 항변했을 때 아렌트는 관료제에 질식한 인간 운명의 아이러니를 떠올리며 슬퍼했을까.
아렌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모두는 유죄라고 말한다면 그건 실제로 철저히 실행한 사람들을 감싸는 게 돼요. 바로 이게 독일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죄책감을 일반화해서는 안돼요. 그건 진짜 죄인들을 감싸는 짓일 뿐이니까요.” 그러고 보면 일부 신중한 유대인 학자들이 아이히만 재판의 국제법적 문제점 등을 들어 아이히만의 사형집행에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음에도, 아렌트는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다는 의미에서 아이히만에 대한 사형집행을 확고하게 찬성한 지식인 중 하나였다. ‘우리 안에 아이히만 있으니 모두가 참회하자’는 식의 해석은 ‘악의 평범성’과는 애당초 상관없었다는 얘기다. 다른 인터뷰에서 아렌트는 딱 잘라 말한다. “우리 각자는 아이히만과 같은 측면을 갖고 있다는 말을 하려던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하려던 말은 오히려 그 반대에요!”
그럼 무얼 말하고 싶었을까. 비밀은 아이히만 조서를 보고서는 낄낄거렸다는 아렌트의 웃음 속에 있다. 웃은 이유는 간단하다. “아이히만이 진짜 어릿광대 같았기 때문”이다. ‘악의 평범성’이란 말은 평범한 척 굴면서 정말 말 같지도 않은 변명만 주절주절 늘어놓고 있던 아이히만을 비웃어주기 위한 말이었다. 아이히만의 이런저런 변명에 대해 “그러게요. 참 평범하셨군요”라고 쏘아붙인 셈이다. ‘너나 잘 하세요’라던 영화 ‘친절한 금자씨’의 이영애 대사를 떠올리게 하는 말이다.
아렌트도 인정하는 부분은 있다. 자신의 이런 반어적인 낄낄거림이 스타일상 문제이며, 또 누군가에겐 상처가 됐을 수 있다는 점은. 하지만 그 뒤에 이런 말도 덧붙였다. “우리가 웃을 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건 주권의 한 형태니까요.” 인간 본성의 적나라한 실체 앞에선 웃음도 때론 무기다.
조태성기자 amorfati@hankookilb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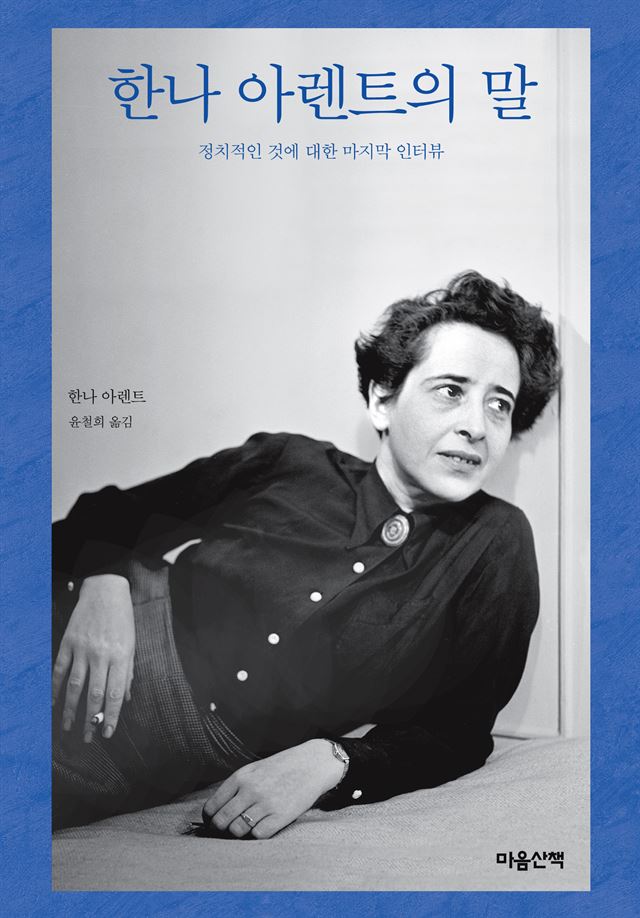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