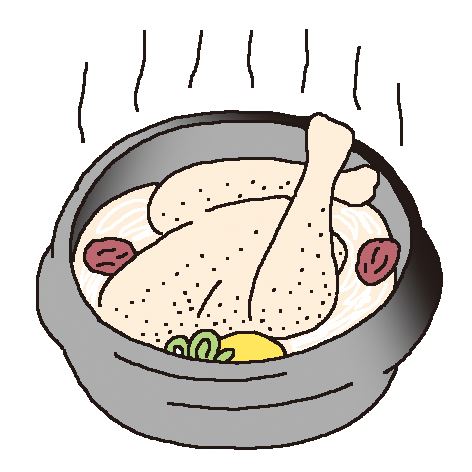
삼계탕 조리법이 언제 정착됐는지는 불분명하다. 닭이야 굽든 삶든 태고 이래의 식재료이니, 인삼이 삼계탕 형성의 핵심 변수였을 것이다. 고려 때까지의 삼은 거의 재배되지 않은 자연산 산삼이었다. 따라서 귀한 산삼을 닭과 함께 삶는 조리법이 정착됐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 조선시대로 넘어와서도 광해군~인조 때의 문신인 박정현의 <응천일록(凝川日錄)>에 ‘황계탕’이 등장하고, 1773년 <승정원일기>에 ‘연계탕’이 등장하지만 삼과 함께 조리한 건 아니었다.
▦ 문헌 상 ‘삼계(蔘鷄)’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건 1886년 개화파 정치인인 김윤식이 쓴 <속음청사(續陰晴史)>가 가장 이르다. 하지만 거기 등장하는 ‘삼계고(蔘鷄膏)’라는 것도 조리법을 보면 국물이 중심인 탕은 아니다. 인삼과 닭을 넣고 푹 고아 마치 경옥고처럼 반응고 상태로 만든 삼계고를 1894년 이제마가 쓴 <동의수세보원>은 설사병 치료제로 소개한다.(음식칼럼니스트 박정배) 이렇게 좁혀가다 보면 문헌 상 요리로서 삼계탕이 등장하는 건 일제강점기인 1917년의 <조선요리제법>이 처음이 된다.
▦ <조선요리제법>에 소개된 ‘닭국’은 ‘닭의 뱃속에 찹쌀 세 숟가락과 인삼가루 한 숟가락을 넣고 잡아맨 후에 물을 열 보시기쯤 붓고 끓이나니라’라고 돼 있다. 적어도 지금 삼계탕의 틀을 갖췄던 건 분명해 보인다. 그때부터 쳐도 삼계탕이 정착된 건 기껏해야 100여 년 전이다. 이후 삼계탕은 양계산업이 발전하고 인삼 재배가 확대되면서 1960년대엔 대표적인 여름철 보양식으로 자리잡기에 이른다. 지금 서울의 전통맛집으로 꼽히는 모모한 삼계탕 전문점들이 창업한 게 그 때다.
▦ 영계 뱃속에 찹쌀 수삼 황기 대추 등을 넣어 여민 뒤 푹 끓이면 인삼 향이 고기와 국물에 골고루 스며 깊고 은근한 풍미를 낸다. 일본 작가 무라카미 류도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생명을 입 속에 넣는 듯한 느낌을 준다’고 했을 정도로 미각적으로도 글로벌한 매력을 갖췄다. 하지만 삼계탕 수출은 2011년 3,077톤이었던 게 엔저 등으로 지난해 1,691톤까지 줄었다. 그래선지 업계에선 최근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삼계탕 중국 수출길이 열리게 된 데 기대가 크다. 중국 진출을 계기로 삼계탕이 태국의 똠양꿍을 능가하는 세계적 명품 탕요리로 도약하길 바란다.
장인철 논설위원 icja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