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대전 중 알바니아 도시 생활상
동화적 상상력으로 희극적 묘사
오랫동안 터전 지켜온 주민들
각자 방식으로 전쟁의 삶 받아들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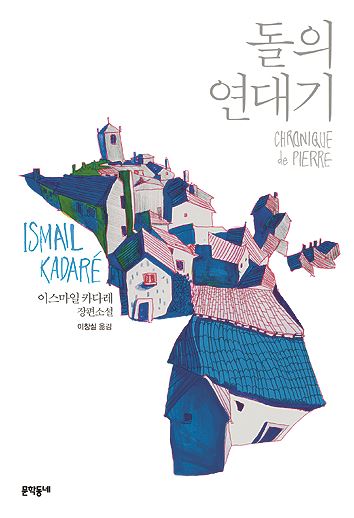
모든 작가는 자신이 나고 자란 곳을 작품의 자양분으로 삼게 마련이지만, 이스마일 카다레 정도면 작가 자신이 조국의 자양분이 됐다고 할 만하다. 1936년 알바니아 남부 지로카스트라에서 태어난 작가는 고등학생 때 시인으로 데뷔했고 27세의 나이에 첫 장편소설 ‘죽은 군대의 장군’을 발표해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0년 뒤 알바니아를 배경으로 한 이 소설로 발칸반도 한 구석의 작은 나라가 전세계에 알려졌고, 유럽에선 ‘이스마일 카다레가 알바니아보다 유명하다’는 농담이 돌았다.
새로 출간된 ‘돌의 연대기’는 2차대전 당시 알바니아에서 일어난 일을 그린 작가의 자전적 소설이다. 고향 지로카스트라를 모델로 한 익명의 도시는 이탈리아, 그리스, 독일의 잇따른 침략으로 며칠에 한 번씩 주인이 바뀌며 혼돈에 휩싸인다. 이는 실제로 1939~1943년 이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로, 작가는 어린 소년의 눈을 통해 광기의 시대를 동화적 상상력으로 그려낸다.
“어떻게 사람들은 그토록 많은 돌과 목재를 모아다가 이런 담벼락과 지붕을 만들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 모든 도로와 집, 하천과 지붕과 굴뚝을 뭉뚱그려 도시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을까.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건, 어른들의 대화에 점점 더 빈번히 등장하는 ‘점령 도시’라는 말이었다. 우리 도시는 점령당한 상태였다. 그건 나도 아는 사실이었지만, 정작 내가 골머리를 앓고 있었던 건 다른 문제였다. 점령당하지 않은 도시란 어떤 곳인지 상상이 되지 않았다.”

아이의 눈에 비친 어른들의 모습은 자못 희극적이다. 폭격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지붕에 난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어 큰 소리로 수다를 떠는 왕할머니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결혼식은 열린다며 빗발치는 폭탄을 뚫고 신부 화장을 하러 다니는 피노 어멈, 도시를 지배하는 국가가 바뀔 때마다 감옥에서 풀려났다 다시 갇히기를 반복하며 감옥의 규율이 형편없다고 불평하는 죄수들…. 이외에도 많은 개성 있는 인물들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전쟁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생을 이어나간다. 서구의 패권 싸움에 찢겨 “고통으로 몸을 뒤트는” 알바니아의 모습은 우리의 근현대사를 돌아볼 때 결코 낯설지 않은 모습이다.
소설은 결국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공산주의를 주창하며 유격대를 조직해 서로 죽고 죽이는 비극으로 치닫는다. 실제 역사에서는 1943년 독일이 알바니아 전역을 점령하고 이듬해 철수한 뒤 같은 해 11월 엔베르 호자가 이끄는 공산당 유격대원들이 인민공화국을 건설, 알바니아는 구 소련이 해체되는 1991년까지 공산주의 국가로 남는다. 그러나 소설은 나치의 깃발이 마을 곳곳에서 펄럭이는 장면에서 끝을 맺는다. 후대의 눈으로 볼 땐 더할 나위 없는 위기 상황이지만, 오래된 돌의 도시에서 살아온 주민들에겐 어제의 고통에 이어 견뎌야 할 오늘의 고통일 뿐이다. 수세기 동안 이 도시를 지켜온 어리석지만 충직한 돌들처럼. “삶의 부드러운 과육이 단단한 돌 껍데기 속을 다시 채우고 있었다.”
황수현기자 sooh@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