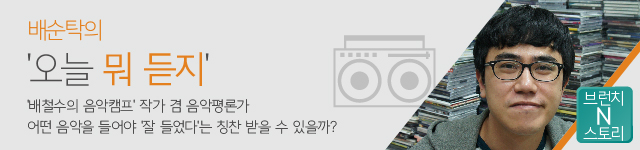
‘유느님’ 유재석과 예능감으로 똘똘 뭉친 유희열이 만났다. 이미 둘은 2013년에 있었던 무한도전 가요제에서 환상적인 궁합을 보여줬던 바, 당연히 둘이 연출할 케미에 모든 이들의 시선이 몰렸다. 게다가 ‘슈가맨을 찾아서’라니 이 파일럿 쇼에 영감을 준 원작 영화를 워낙 좋아한 탓에 기대치를 높게 설정하고 본방을 사수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뭐랄까 만족과 실망이 교차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우선 만족감은 여러 작은 코너를 중간 중간에 삽입해 몰입감을 놓치려 하지 않았다는 것과, 실망감은 ‘슈가맨을 찾는 과정’이 생각보다 싱거워서 그만 맥이 탁 풀려버리고 말았다는 점이다. 프로그램 평가는 여기까지. 이번 주는 바로 오리지널 영화에 대해 써보려 한다. 저 유명한 ‘서칭 포 슈가맨’이다.

영화 ‘서칭 포 슈가맨’의 줄거리는 기실 별다른 게 없다. 미국에서 활동하다가 갑자기 사라진 슈가맨의 흔적을 한참 떨어진 남아공에서 발견한다는 것이 거의 전부다. 슈가맨의 정확한 리얼 네임은 식스토 디아즈 로드리게즈(Sixto Diaz Rodriquez). 1920년대에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자를 부모로 둔 그는 디트로이트에서 태어나고 성장하며 찢어지게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이후 디트로이트를 무대로 라이브 활동을 시작했는데, 작품을 발표하기 전까지만 해도 거의 노숙자나 다름없는 삶을 살았다고 전해진다.
그의 재능에 처음 주목한 곳은 서섹스 레코드(Sussex Records)였다. 레코드사에서 제공해존 당시 로드리게즈의 작업 환경은 나쁘기는커녕 최상이라고 해도 괜찮을 수준이었다. 녹음에서부터 홍보에 이르기까지, 실력파 동료들이 함께 하며 그에게 힘을 불어넣어줬다. 영화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얘기된다. "자본과 인력, 모든 게 로드리게즈를 위해 준비되어있었다. 우리는 그의 재능과 실력을 믿었다. 음악도 훌륭했다. 그런데 레코드가 팔리질 않았다.“ 서섹스 레코드와 총 2장의 앨범을 낸 로드리게즈는 이후 레이블과 결별하고 대중의 시야에서 홀연히 사라졌다.
과연, 영화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로드리게즈의 음악은 레코드사의 평가 그대로다. 장르적으로는 포크에 해당될 그의 음악은 무엇보다 시적이면서도 지극히 정치적이다. 그는 가사 곳곳에 매설된 빼어난 상징들을 통해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한 은유를 정말이지 인상적으로 길어 올린다. 그 중에서도 'Jane S. Piddy'라는 곡의 다음 대목을 읽어보라. 지금 시대에도 그 메시지가 유효한 것만 같아서 어떤 섬뜩함마저 전해줄 테니까. "궁정의 광대는 대답이 없지. 들어줄 사람도, 부를 사람도 없으니까." 그의 음악이 이 영화를 통해 재발굴되어 시공을 초월한 명곡으로 인정받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다.
남아공 사람들은 로드리게즈의 음악 ‘I Wonder’를 들으면서 그제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배웠노라고 고백한다. “국가가 잘못되었다면, 국가에 반항해도 되는 것이구나.” 이를 통해 그의 앨범 ‘Cold Fact’는 남아공에서 비틀즈의 음반들과 맞먹는 지위를 누리게 된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질문이 하나 남을 것이다.
“왜 미국에서 상업적으로 실패한 로드리게즈의 음악이 남아공에서 기적처럼 부활했을까.”
정답은 바로 ‘시대와의 만남’이다. 미국인들은 밥 딜런(Bob Dylan) 같은 뮤지션들을 통해 로드리게즈 같은 스타일의 포크를 1960년대에 이미 경험했다. 게다가 미국 사회는 1970년대에 공동체가 아닌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시대로 접어들고 있었다. 보통 1960년대를 ’We Decade(우리의 시대)’, 1970년대를 ‘Me Decade(나의 시대)’라고 정의하는데, ‘우리’를 노래하는 로드리게즈의 음악이 설득력을 발휘할 리 만무했던 것이다.
남아공은 달랐다. 1970년대 초반의 남아공은 보수적이었다. 인종차별은 극심했고, 대한민국의 70년대처럼 어디에서나 검문, 검색을 받아야 했던 폐쇄적인 구조의 사회였다. 즉, 단순하게 비교하자면 로드리게즈는 그들에게 1960년대의 밥 딜런 같은 존재였던 것이다. 우리 쪽으로 비교하자면, 한대수의 ‘물 좀 주소’나 김민기의 ‘아침 이슬’ 등의 음악이 1970년대에 미쳤던 영향력을 떠올리면 될 것이다.
로드리게즈가 이렇게 영화를 통해 뒤늦게나마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이유, 그건 아마도 세상의 돌아가는 꼴이 그렇게 변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한다. 극한의 생존경쟁이 심지어 미덕으로 포장되고 있는 신자유주의라는 폭력적인 패러다임 하에서, 로드리게즈의 음악들은 의미심장하다 못해 쓰라리게 다가온다. 예능 프로그램으로서의 ‘슈가맨을 찾아서’와 영화 ‘서칭 포 슈가맨’의 가장 큰 차이점을 하나 꼽자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예능에 거대한 시대정신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알고는 있자는 뜻에서 적어둔다.
음악평론가 겸 배철수의 음악캠프 작가
배순탁 '오늘 뭐 듣지' ▶ 시리즈 모아보기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