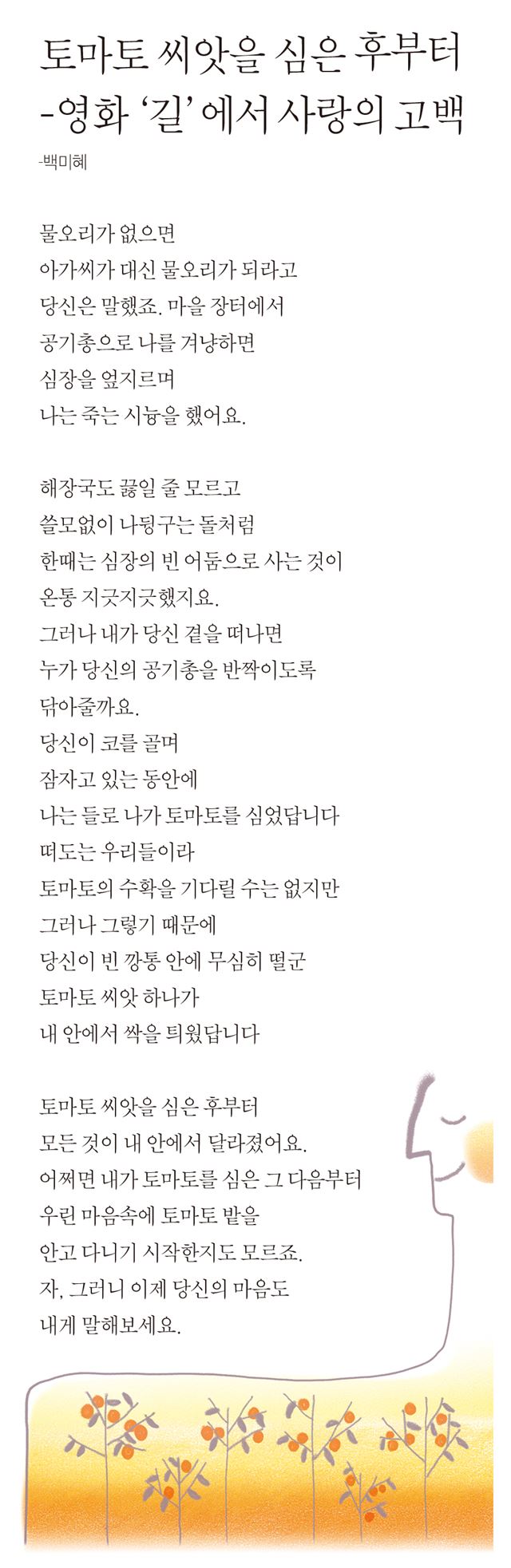
이 시를 처음 읽었던 스무살 무렵 저는 무척 낭만적이었나 봐요. 물오리가 없으면 물오리가 되라는 말이 그리 멋질 수가 없었어요. 당신이 소녀가 되라면 소녀가, 소년이 되라면 소년이 되고 싶었는데 물오리쯤이야 무슨 상관이겠어요. 혼자가 아닌 것만으로도 삶이 충만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죽는 시늉을 하라는 사람이 회장님이었다면 노동쟁의라도 했겠지만 내 심장의 빈 어둠을 채워준 당신의 부탁이니 달콤하기만 하다는 식이었지요.
그런데 요즘엔 왜 다르게 읽히는 거죠? 누군가 내 곁에서도 여전히 심장의 어둠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당신이 이제 해장국 끓이기의 달인이 되었다는 것도 나는 알고 있어요. 당신은 내가 구식 공기총처럼 녹슬어 갈까봐 떠나지를 못합니다. 청춘의 명랑과 기쁨이 봄날의 빛처럼 사라진 뒤에도 나를 사랑해주었습니다. 지긋지긋하게, 고통에도 무심히, 길가에 또 무언가를 심으며. 그러니 이제 당신의 슬픔을 내게 말해주세요.
진은영 시인ㆍ한국상담대학원대학 교수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