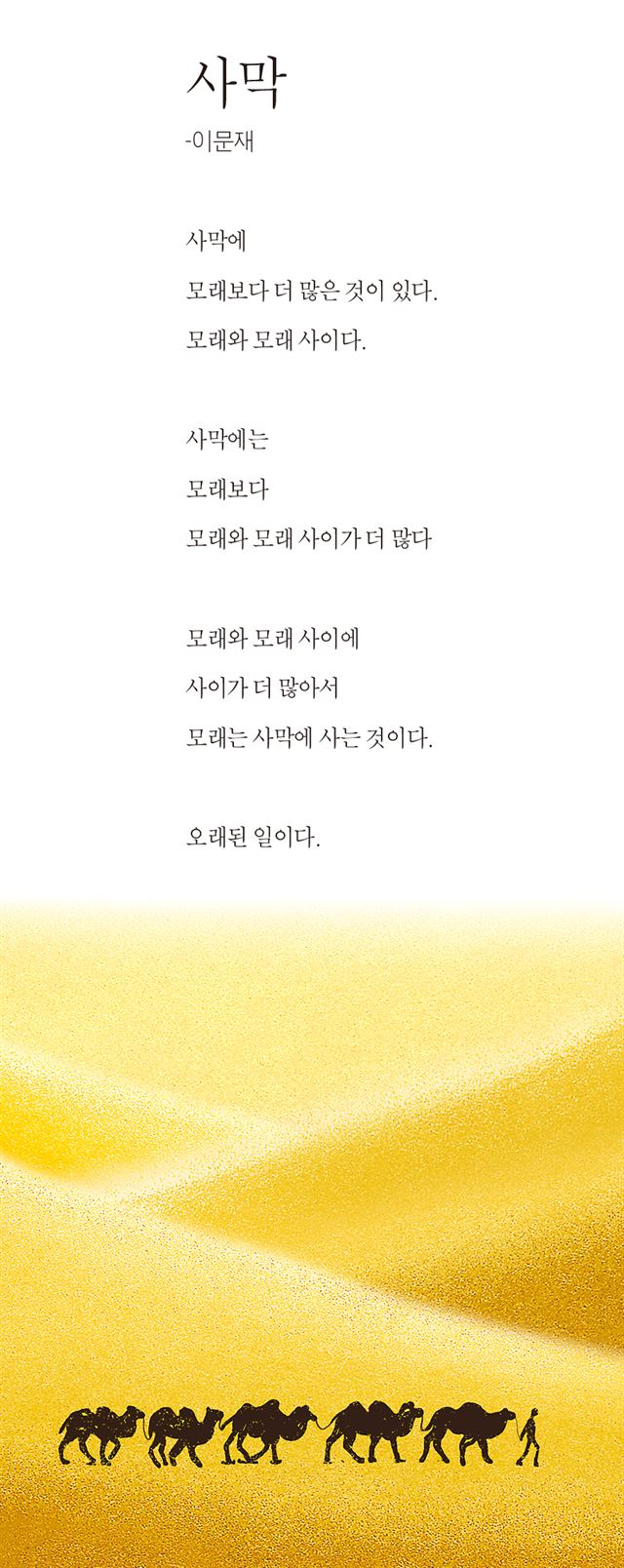
폭염이 계속 되네요. 모래사막의 사람들은 어찌 살까요? 햇볕은 살의를 담은 듯 뜨겁고 가도 가도 모래만 가득하니 그 지루함은 견디기 힘들 정도겠지요. 물론 사막을 사랑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소설가 르 클레지오는 바닷물에 손을 담그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 어느 강의 물을 만지는 느낌이 들듯이 사막먼지에 손을 올려놓으면 태어난 땅을 만지는 기분이 든다고 썼어요. 사막은 광막한 침묵만이 펼쳐지는 곳도 아닙니다. 거기서는 바람이 만든 모래언덕에서 모래들이 흘러내리는 소리가 사르륵사르륵 들리겠지요. 숲에서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가 나듯이 말입니다.
시인에게 사막은 어떤 곳일까요? 그에게 사막은 모래와 모래 사이가 가장 많은 곳이군요. 모래는 자연의 힘으로 만들어진 돌 부스러기라고 합니다. 물과 바람과 세월이 단단한 것을 애써 잘게 부숴 놓았어요. 시인은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어야 할 것들이 부서져버려 마음이 황폐해졌다고 탄식하는 중일까요? 아니면 비슷한 것들 사이에도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 오래오래 함께 하려면 사물과 사물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일까요? 어느 쪽일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궁금한 게 있어요. 내가 단단히 결속되어 있다고 믿는 한 사람,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당신은 어떻게 느끼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래된 일이에요.
진은영 시인ㆍ한국상담대학원대학 교수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