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농사를 지으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귀농에 대한 질문을 받곤 한다. 어떤 이는 꽤나 진지하게, 어떤 이는 지나가는 투로 묻는데 그 중에는 벌써 10년 넘게 끊임없이 귀농 계획만 짜고 있는 이도 있다. 아마 귀농하고픈 마음이 떨쳐버릴 수 없는 취미가 된 듯도 싶다. 며칠 전에도 서울에서 나고 자라 서울에서만 살아온 친구 하나가 문득 전화를 걸어와 장시간 귀농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직장에 잘 다니며 사는 줄 알았더니 그간 어지간히 지친 모양이었다. 이제 서울을 뜨고 싶다며 진지하게 귀농을 생각하고 있었다. 나를 아주 베테랑 농군으로 생각하는 그에게 나는 별달리 도움이 될 말을 해주지 못했다. 물론 귀농을 권하지도 않았다.
아직 나도 초보 농군이던 시절에 서울에 살던 이종사촌 부부가 우리 집을 들락거리더니 기어이 땅을 마련하여 이웃으로 귀농한 적이 있었다. 농촌으로 돌아와 과수원을 하려던 오랜 꿈을 이룬 나도 의욕에 넘쳐 있던 때인지라 그들의 귀농을 적극 권했었다. 긴 이야기를 짧게 줄이자면 그들은 결국 7년을 버티다가 거의 빈털터리가 되어 아예 다른 나라로 이민을 떠나버렸다. 아무 준비 없이 마치 농사에 정통한 것처럼 보이는 사촌의 방조를 기대하며 귀농했던 그들은 내가 보았던 가장 처참한 실패 사례였다. 속으로 얼마나 나를 원망했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등골이 서늘하다. 그런 터에 내가 누구에게 다시 귀농을 권한단 말인가.
우리 마을에는 귀농 4년 차인 40대 중반의 젊은 농부가 한 사람 있다. 본래 부모가 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고 그의 고향이기도 하니까 귀향이라고 해도 되겠다. 그는 대학까지 마치고 큰 건설회사의 토목기사로 일을 하고 있던 터라 그의 귀농은 뜻밖이었다.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져 해고를 당했고 다른 곳에 취직도 어려워 농사를 짓기 위해 돌아온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누구의 부추김을 받았는지 논에 대규모 비닐하우스를 지어 오이 농사를 시작했다. 딱하게도 그는 겨울에 신선채소를 재배하면 수지가 맞을 거라는, 이미 오래 전에 깨진 신화를 여전히 믿고 있었다. 마치 가난한 마을에 정착한 선각자처럼 의욕적으로 시작한 하우스 농사에서 그는 거듭된 실패를 하고 있는 중이다. 결국 그는 불과 4년 만에 마을에서 가장 빚이 많은 농부로 전락하고 말았다. 듣기로는 억대를 훌쩍 넘었는데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더 많은 비닐하우스를 지어 ‘한 방’을 노린다고 했다. 그가 꿈꾸는 한 방이란 자연재해 같은 이유로 그가 재배하는 작물이 천정부지로 값이 뛰는 그런 사태를 말한다. 이게 소위 수많은 귀농 가이드 책자들이 소개하는 억대 농부의 진실이다. 물론 예외적인 성공도 있겠지만 나는 믿지 않는다. 땅이 정직하다는 의미는 그런 예외가 거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서른한 살 때 부모님과 함께 귀농하면서 나는 처음부터 과수원을 할 생각이었고 사과나무와 복숭아나무를 심었다. 소위 밀식재배라는 새로운 방법으로 과수를 심었는데 몇 년 지나지 않아 그게 나무와 토양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는 것임을 깨달았다. 마치 공장에서 공산품을 생산하듯이 나무에 강한 전정을 하고 비료와 농약을 쏟아 붓듯 주어야 했다. 여러번의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나는 과수원은 진정한 의미에서 농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다. 남의 논을 얻어 양식거리를 하고 텃밭에 푸성귀를 심어먹는 것으로 대개 자급자족을 했지만, 철저하게 시장에서 결정되고 그 시장에 목을 매는, 그것도 반드시 필요한 1차 생산물도 아닌 과수원 농사는 내가 농군이 아닌 일종의 장사꾼이 아닌가 하는 자괴감을 떨치기 어려웠다.
귀농은 결국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다. 돈과 경쟁, 외화(外華)에서 벗어나겠다는 굳은 마음이 없으면 이미 시작부터 실패다. 누구보다 나 자신에게 끊임없이 되새기는 질문이다.
최용탁 소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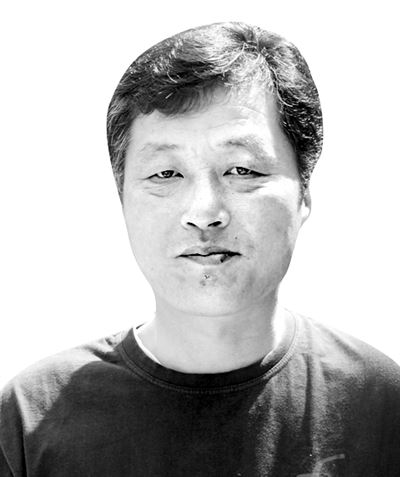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