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번역되어 나온 장편 소설‘네메시스’에서 필립 로스는 2차 세계대전 막바지인 1944년, 미국 뉴어크 시의 위퀘이크라는 유대인 동네를 무대로 폴리오(급성 회백척수염, 흔히는 척수성 소아마비)와의 싸움에서 패배한 한 남성 영웅의 이야기를 전한다. 50년대에 예방 백신이 나온 이래 지금은 거의 사라진 질병이 되었지만 20세기 초중반, 감염원과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채 주로 어린이들을 덮쳤던 폴리오는 실로 무서운 유행병이었다.
초등학교 체육교사이자 놀이터 감독으로 갓 부임한 ‘캔터’라는 젊은이는 전쟁터로의 징집을 면제받을 정도의 지독한 근시이긴 해도(그는 이 때문에 ‘남자로서’ 나라를 위해 마땅히 할 일을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린다), 투창과 역도로 단련한 강인한 체력에 책임감과 정의감이 넘치는 사려 깊은 인물이다. 그는 폴리오를 퍼뜨리겠다고 위협하며 유대인 혐오를 공공연히 드러낸 이탈리아계 불량배 무리를 제압하며 동네의 영웅으로 떠오르지만, 사실 그전부터 아이들은 그를 존경하고 있던 터였다. 매사 정직과 책임감으로 스스로를 규율하고 단련하는 굳센 캔터의 모습은 그것이 평생 반유대주의와의 전투 속에서 삶을 지켜온 할아버지의 훈육 덕분이든, 자신의 태생적 불우와 싸운 ‘미국적 꿈’의 투영이든 아름답다.
그런데 캔터는 그 자신을 강건한 인물로 만든 바로 그 바탕 때문에 삶을 망가뜨리는 역설에 이른다. 캔터 역시 폴리오에 감염되어 불구의 몸이 되기도 하지만, 그는 자신이 놀이터의 아이들과 인디언 캠프의 아이들에게 폴리오를 감염시켰다는 죄책감에 빠져(만에 하나 그가 그랬다고 한들 누가 그를 비난할 수 있겠는가) 그가 누릴 수 있었던 달디 단 사랑과 행복의 가능성을 거절하고 고독과 회한, 고통과 좌절의 좁은 울타리 안에 스스로를 가두어버린다. 그의 정직과 책임감은 너무 높은 기준점을 갖고 있었던 셈이다. 놀이터의 아이로 자라났고, 그 해 여름 폴리오의 피해자이기도 했지만 캔터 선생과는 달리 장애를 딛고 세상 속으로 나온 이 소설의 화자 메스니코프는 27년 만에 만난 자신의 우상에게 말한다. “혹시라도 선생님이 범인이었다 해도, 선생님은 전혀 책임이 없는 범인이었다고요.” 그러나 그는 또 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체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엄격한 선(善)을 천성적으로 짊어지고 있는” 캔터 선생님 같은 이는, “자신에게 어떤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반드시 죄책감을 느낀다”는 걸.
어떤 사람에게는 치유의 길을 찾을 수도 있는(이것이 쉽다는 말은 아니다. 메스니코프는 자신이 ‘엄청 운이 좋았다’고 말한다) ‘사회적 비극’이었던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도무지 그 답을 찾을 길 없는 ‘원죄의 드라마’가 된다. 캔터의 투명한 정신 안에는 자신과, 그 무구한 아이들에게 닥친 재앙의 정의롭지 못함, 그 잔혹한 우연을 납득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 그는 전능하든가 아니면 무능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그 자신이 그렇게 비난하던 ‘하느님’의 자리를 내면화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여기에는 지난 세기, 실패한 거대 담론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필립 로스는 노련한 작가답게 이 두 사람의 태도 중 어느 쪽에도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 그는 질문만 던져놓는다. 캔터에게 알게 모르게 주입된 남성적 영웅주의나 도덕적 결벽성이 얼마나 위험하고 억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는 그 자신의 텅 빈 삶이 증명한다. 그러나 이 소설의 마지막은 캔터 선생의 투창 모습, 그 찬란했던 무적(無敵)의 기억으로 끝난다. 자신의 삶을 형성하려고 한 모델은 분명 낡은 도덕적 틀과 시대적 한계에 갇혀 있었는지 모르지만 사실 캔터는 나무라기 힘든 사람이다. 생각해보면 그는 그 자신에게 엄격했을 뿐이다. 타인에 대한 도덕적 단죄와 평결은 난무하나 정작 책임과 약속의 윤리는 점점 얇아져만 가는 시절에 버키 캔터라는 인물은 기억해두고 싶은 사람이다.
정홍수 문학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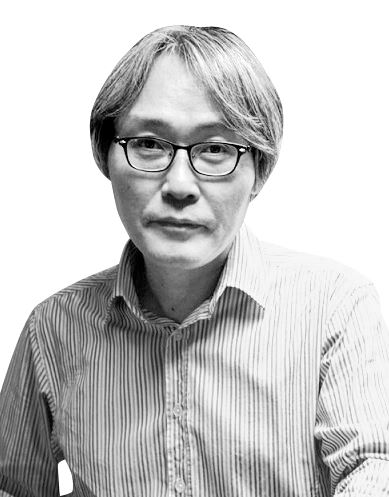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