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의존 탓 학내 비리 침묵, 인쇄 마치고 배포 못하기도
미국에선 재정 독립 추진, 교수ㆍ동문ㆍ대학생 함께 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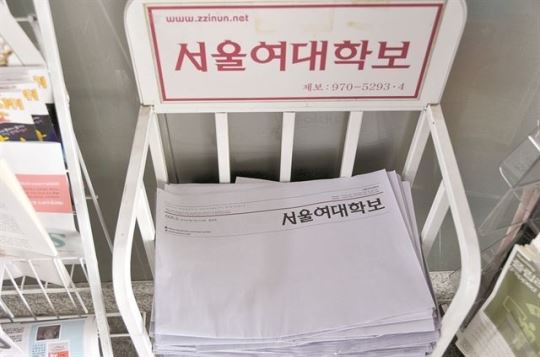
대학언론의 위기다. 공론의 장이 돼야 할 대학언론이 재정압박, 발행부수 감소, 대학의 압력, 학생들의 무관심 등 안팎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장 따갑게 듣는 비판은 홍보지 전락이다. 과거에는 지면에 잘 담지 않는 학교 홍보성 기사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산업과 손잡은 학교 달릴 준비 마치다’, ‘총장, 대학운영 방식 개선하겠다’, ‘최첨단 보안 장비로 안전한 캠퍼스 만들기’, ‘심층보도-대학 환경을 생각하다’,‘미리 알아보는 대학원, 뭐든지 물어보세요’. 최근 주요 대학 학보에서 비중 있게 다룬 기사 제목이다. 대부분이 보도자료를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학교 정책만 나열하고 있다. 대학 내 문제점을 다룬 기사들은 소극적으로 처리되거나 보이지 않는다.
이는 학내 현실 외면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적지 않다. 예컨대 중앙대 사태다. 중앙대 독립 학보인 잠망경은 지난달 박용성 전 이사장이 중대 선진화를 공식 선언한 2월부터 시작된 학과 구조조정 과정, 두산재단이 중앙대를 인수하면서 겪은 갈등, 그리고 박 전 이사장의 사퇴까지 1면을 포함해 5개면에 걸쳐 담았다. 박 전 이사장이 검찰 조사까지 받을 정도로 사회에 큰 이슈가 됐던 사안이라 대학신문 입장에서 비중 있게 다룰 소재다. 반면 중앙대 공식 학보인 중대신문은 5월18일자 1면을 통해 박 전 이사장이 검찰에 소환됐다고 간단히 실었다. 강남규(정외과 4년) 잠망경 편집장은 “재단과 관련된 사안은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보에선 다루기 힘든 주제”라고 했다.
대학언론에 대한 대학의 경시는 발행부수, 지면 축소에서도 드러난다. 2000년대 초중반만 하더라도 주 2회 발간하는 학보도 있었으나 이젠 매주 발행도 쉽지 않다. 경희대 대학주보도 예산축소로 올해부터 기존에 매주 발행해오던 신문을 격주로 발행하고 있다. 대학신문 예산을 보통 10~50%가량 줄인 까닭이다. 서울지역 4년제 대학에서 주간교수를 했던 A교수는 “정치계에서 반값 등록금 공약을 내놓은 이후 등록금 인상이 쉽지 않자 긴축 재정을 이유로 학보의 발행부수와 면수를 줄였다”며 “예산절감만이 아닌 비판적인 기사를 내놓기 싫어하는 학교 측의 속내가 담겨 있는 행동이었다”고 말했다. 학내 비리 문제만 아니라 상업주의에 물든 캠퍼스 현실에서 비판을 외면하려는 의도라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신문의 주간교수(교직원)를 통한 기사 수정, 삭제가 다반사다.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2013년 실시한 ‘대학 학내 언론의 자유’ 설문조사에서도 34.4%의 학보사가 ‘기사검열을 받았다’고 답할 정도다.
물론 학생기자의 질적 수준, 기사의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을 고려할 때 학교 측이 기사 내용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대응이 과하고 정도가 심한 경우가 적지 않다. 1980년대 군사정권 시대를 방불케 할 만큼 고압적이고 물리적이다. 위헌적 학칙 조항과 학교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한 비판 보도로 6월호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삼육대신문이나, 청소노동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졸업생 143명의 성명서를 1면에 담으려 하다 주간교수의 반대로 5월27일자 1면을 백지 발행한 서울여대 등이 대표적이다. 유명 사립대 학보사 기자 출신인 직장인 박모(30)씨는 “신문 인쇄가 마친 월요일 아침이라도 학보 내용이 총장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주 발행이 취소될 정도로 관여가 심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들은 편집권 침해를 주장하며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 정작 학생들의 관심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이다.
대학신문의 열악한 사정은 기자 충원마저 고심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과거 20~30여명의 기자들을 보유했던 것과 달리 상당수 대학 신문이 10명 내외의 구성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면 채우기조차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이예원 고대신문 편집국장은 “과거 1학년만 신입 기자로 받던 것과 달리 5년 전부터 학년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도 바꿨지만 경쟁률이 2대1 정도 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위기의 대학신문이 스스로 역할 재정립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구성원들 사이에서 나오는 이유다. 김세은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가뜩이나 학생들에게 멀어진 대학신문은 최근 소셜네트워크(SNS)의 발달로 소통의 장 역할 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사립대에서 5년 동안 학보사 담당을 맡았던 한 교직원은 “지금 상태로 대학신문이 갈 수는 없다. 폐쇄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독자층인 학내 구성원이 관심을 갖고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로 재무장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류웅재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신문을 만들 목적과 의지가 있다면 미국 대학신문들처럼 재정 독립을 추진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며 “다만 동문, 교수, 대학본부, 학생기자 등으로 편집자문위원회를 꾸려 편집국장을 임명하고, 학교 언론학과와 연계된 기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식의 기구 구성이 함께 가야 구성원 모두에게 인정받는 학내 신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관규기자 ac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