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를 떠나겠다는 한 고등학생이 있다.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온 김다운(17)씨다. 김 씨는 5~7월 사이 진주 시내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그는 “경쟁만 남은 배움 없는 학교에 있을 수 없다"며 자퇴를 선언했다. 그리고 이어지는 1인 시위에서 새로운 물음을 던졌다. “여러분의 학교엔 진정 배움이 있습니까?”
그의 물음을 보고 고등학교 때 본 애니메이션이 떠올랐다.

‘먼저 사람이 되어라’라는 문구를 내건 학교가 있다. 학생들은 양, 사자, 고릴라와 같은 동물의 모습이다. 이 애니메이션의 주인공 ‘원천’은 고릴라인데, 그는 장수풍뎅이 ‘장풍이’를 데리고 다닌다. ‘원천’의 꿈은 곤충을 연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곤충들이 그에게 ‘왜 그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으며 학교에 있냐’고 묻자 원천은 이렇게 대답한다.
“사람이 되려고.”
원천은 이야기를 나누다 문득 깨닫는다. 이미 그는 자기가 목표로 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걸. 사람이 된 후에 곤충을 연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미 곤충을 연구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자신의 모습이 그 자체로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다. 다음 날 학교에 간 원천은 고릴라가 아닌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있었다. 사람이 된 원천을 보고 친구들은 기뻐하지만, 담임 선생님은 그렇지 않다. 그는 원천의 이마를 분필로 때리며 이렇게 말한다.
“ 너 왜 니 맘대로 사람이 되고 그래. 아직은 사람이 되면 안 돼. 사람은 니 맘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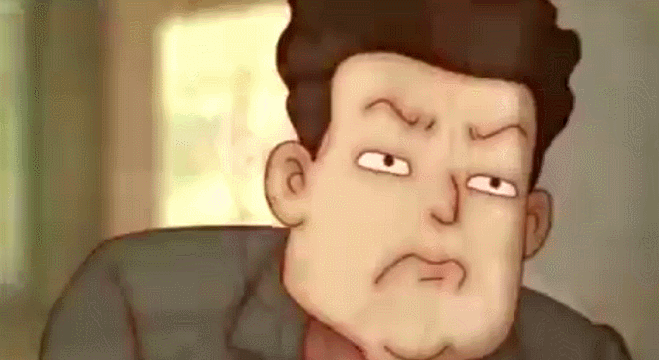
우여곡절을 겪지만, 결국 원천은 다시 고릴라가 되어 등굣길에 나선다. 친구들과 나는 애니메이션이 끝나고 한참을 훌쩍거렸다. 사람이 되지 못한 원천의 마음을 알 것 같아서였다.
‘대학 가야 사람 된다’는 급훈이 다들 그렇게 낯설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닭장 같은 독서실을 견디고 대학에 왔다. 사람 취급 못 받는다는 마지노선을 넘었다. 그리고, 2010년 대학교에 입학했다. 들떠서 꾸부정하게 힐을 신고 다니던 새내기였다. 내가 입학한 그 해 3월, 고려대학교에 대자보가 하나 붙었다. "오늘 나는 대학을 그만둔다, 아니 거부한다"라는 제목의 그 글은 경영학과 3학년 김예슬 씨의 자퇴 선언문이었다. 그는 학생들을 우수한 경주마로 길러내고 경쟁에서 이기는 규격화된 인간 제품을 만드는 것을 비판했다. 도서관 앞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들을 들었다. 공감의 말도 있었고, ‘그래서 어쩌라는 것이냐’는 부정적인 반응들도 있었다. 나는 그 소리들을 스쳐 지나갔다.
일단, 남들 말대로, 대학에 오니 좋았다. 맘대로 술도 먹고 화장도 하고 옷도 입고. 대학에 안 가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이었지만 ‘대학생으로서’ 술도 먹고 화장도 하고 옷도 입으니 더 좋았던 것 같다. 자유로워도 괜찮다. 실패해도 괜찮다. 그런 자격증을 얻은 것 같았다. 한 반 년 정도 더 좋았다. 첫 학기가 지나고 나서 ‘200명 씩 줄지어 앉아 교과서를 외우는 것도 대학교육인가’ 생각했다. 교수님 말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적으려고 녹음하고 녹취본을 만드는 게 ‘교육’인가 생각했다. 그래도 잠깐이었다. 나는 대학생이라는 ‘자격’을 얻은 것에 만족했다.
경쟁 사회, 학벌 사회라는 건 승자와 패자가 존재하는 구도였고, 나는 승자의 편에 서서 여러 번 학벌을 팔아먹었다. 그걸로 대학 생활 반 정도의 생활비를 벌었다. 한 두 해 전까지 똑같이 교복을 입고 있었는데, 대학교 잠바를 입고 나니 신분이 바뀌었다. 누군가에게 잔소리를 해도 그게 멘토질로 팔리고, 승리의 경험으로 포장됐다. 방학 때마다 멘토링 캠프 아르바이트를 했다. 중고등학생 애들을 앉혀놓고 공부를 하나 안 하나 돌아보면서 잔소리하는 아르바이트였다. 열흘 정도 캠프를 다녀오면 손에 백 만원 넘는 돈을 쥘 수 있었다.
싫다는 애들을 열 시간씩 책상 앞에 앉혀놓고 쥐어짜낸 돈이었다. “선생님, 공부를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하고 애들이 물으면, 사실 솔직하게 대답하고 싶었다. ‘나도 몰라.’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니까, 박태환도 팔고 김연아도 팔고 온갖 명언을 조합해서 팔았다. 다음 학기 생활비도 벌고 여행갈 돈도 벌려면 그래야 했다. 비겁해지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내가 하는 협박이 거짓말인 것도 아니었다. 대학생이 되지 않으면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일들이 이렇게나 많단다. 틀린 말은 아니었다. 사무직 인턴을 하려고 해도 대학생이 자격 조건으로 붙는 곳이 많다. 아주 대단한 일을 할 게 아니라도 그런 ’자격‘이란 게 필요하더랬으니까.
그 자격이 얼마나 공허하게 쓰이는지는 굳이 부연설명 하지 않았다. 불안감을 조장해야 돈 버는 산업이 있고, 나는 거기 기생하고 있었다. 좋은 대학교의 학생증이라는 게 가끔 일베에서 ‘난 밑바닥 병신은 아니다’라는 걸 인증할 때 쓰이는 쓰레기가 되기도 한다는 건 말하지 않았다. 자기가 ‘공부의 신’이라며 애들 데리고 강의하면서 ‘노력만 하면 되는데 왜 노력을 안 하냐’고 협박하는 또래 선생이 얼마나 한심해 보이는지도 말하지 않았다.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그리고 스스로와 닮아서 더 한심해 보이는 이 견고한 학벌 사회의 ‘승리자’들을 돌아보면서 생각했다. 비틀린 승리의 경험은 오히려 독이 된다. 차별하고 상처 주는 질서를 반복하면서 우리는 함께 상처받고 있다. 나는 자학하지 않고 노력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 한참 노력해야 했다. 무한동력 기계도 아닌데, 더 노력하라며 스스로를 계속 학대하다간 'Burn Out', 말 그대로 소진될 것이라 느꼈다. 행복하게 살아남는 법이 어려웠다.

각자도생이 한창인 때에, 누군가는 학교를 떠난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기업이 되어버린 학교를 거부한다 말했다. 함께 살기를 외면하는 때, 누군가는 안녕들 하냐고 물었다. 인문사회계열, 그리고 예체능계열 학과들이 차례로 통폐합되었고, 마스크를 쓰고 시위하던 학생들은 어느 샌가 어디론가 사라졌다. 건물들 더 근사하게 짓겠다며 파헤친 교정에서, 너저분한 공사판에서 내 대학시절이 끝났다.
고려대 김예슬과, 중앙대 김창인, 그리고 진주여고의 김다운은 학교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런 상징적 선언과 별개로 이미 학생들은 학교교육의 가치가 무엇인가 의심하고 있다. 나는 학교에 ‘진정 배움’을 기대한 적이 있는지부터 돌아보게 된다. 그런 선언 없이, 학교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 선언하지 않고, 학교에서 길을 잃는 이들이 있다.
줄 서서 대학에 입학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애들이 대학에 가장 많이 가는 나라다. 비싼 졸업장을 들고 줄 선 대학생들은 이제 사회 앞에 섰다. ‘먼저 사람이 되라’고 대학 문 앞에 아이들을 줄 세운 국가 교육은 이들을 책임질 수 있을까. 나는 그럴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결국 출발선에서 다시 행복을 찾는 것도, ‘사람 됨’의 조건을 세우는 것도 다시 각자의 몫이다. 각자의 결단이다.
칼럼니스트
● 애니메이션 '사람이 되어라'가 궁금하다면
썸머 '어슬렁, 청춘' ▶ 시리즈 모아보기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