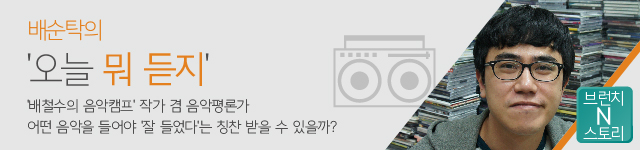
저녁노을이 지고 있는 어느 날이었다. 원고를 쓰다 잠시 쉴 겸 베란다에 나가 밖을 바라보는데, 어린아이의 칭얼거림이 저 밑에서부터 들려왔다. 엄마, 아빠와 함께 어딘가로 가야 하는 아이는 아무래도 목적지가 영 마음에 들지 않나 보다. 엄마의 잔소리를 한바탕 듣고서야 아이는 아빠 품에 안겨 차에 올라탔고, 가족이 탄 차는 금세 골목을 빠져나가 내 시야에서 멀어졌다. 왜인지는 몰라도 그 풍경을 잊지 못한다.
우울한 날이면 자전거를 타고 동네 시장으로 향한다. 시장길을 따라 천천히 가다 보면, 이것저것 마구 뒤섞여있는 냄새와 소리가 후각과 청각을 부드럽게 파고든다. 소리와 냄새는 골목 전체에 은은하면서도 완강하게 배어있다. 시장의 소리를 듣고 냄새 맡을 때마다 울컥하는 감정이 내 몸 전체로부터 퍼져 나온다. 왜인지는 모르지만, 그 소리와 냄새를 또한 잊지 못한다.

라디오 방송에서 날씨와 계절은 여전히 중요하다. 되돌아보니 지난 몇 년 간은 유난히 쓸쓸한 노래들을 많이 받고 자주 틀었다. 마음이 허할 때마다 엘리엇 스미스의 ‘Miss Misery’를 무의식적으로 찾는 건, 내 오랜 습관 중의 하나다. 여름이 되고, 이제는 좀 그만 들어도 되겠다 싶어 마음의 한편을 쓸어내린다. 이번 주말에는 자전거를 타고 한강변에 나가볼 참이다. 온몸의 죽어있던 세포들이 여름날의 강건한 초록빛처럼 일제히 깨어나 일어날 것이다.
떠올려보건대, 내 음악 듣기의 역사는 전투적이었다. 실전으로 치자면 ‘야전’에 해당될 것이다. 좀 더 많은 음악을 듣고자 신촌의 음악전문 바에서 알바를 하며 디제이들에게 배움을 구했다. 그 시절, 음악은 나에게 하나의 거대한 우주였다. 모르는 노래가 너무 많아서, 이걸 어떻게 다 꿸까 싶어서, 좌절감에 휩싸였던 나날들을 기억한다. 온몸을 귀로 만들고 싶던 시절이었다. 매달 25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으면 15만원을 CD 사는데 다 써버리고, 남은 10만원으로 한 달을 겨우 견뎠다. 그 시절, 나에게 술과 끼니를 무시로 제공해준 친구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갚을 차례다.
처음에는 음악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마냥 부러웠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있다. 음악에 대한 직업을 얻는다는 건, 음악에 대한 순수를 상실한다는 것과 어느 정도는 동의어다. 더 이상 음악이 두근거림으로 찾아오지 않을까 봐, 매 순간 마음을 졸이며 음반을 사고 공연장을 찾아간다. 나보다 더 똑똑하고 성실하고 재치 있는 사람들은 그냥 존경해버리면 그뿐이다. 다만 나보다 더 음악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질투를 느낀다. 그 어떤 일에서든 애정은 곧 능력이다.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이영표, 아니 공자님 말씀까지 나왔으니 뭘 더 보태겠나.
그러나 진실로 고백하건대, 음악이라는 것이 별 게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 어떤 경우에도 음악은 삶보다 위중할 수 없다. 음악뿐만이 아니다. 영화도, 문학도, 그러니까 예술이라 불리는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다. 소설가 김훈은 어떤 인터뷰에서“나는 문학이 인간을 구원하고, 문학이 인간의 영혼을 인도한다고 하는, 이런 개소리를 하는 놈은 다 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참혹한 현실은 언제나 영화보다, 문학보다, 음악보다 조금 더 빠르다. 그러니까 예술은, 이 현실과의 간극을 어떻게든 줄여보고자 하는 몸부림일 것이다. 이 몸부림은 때로 허망하지만, 몸부림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기적과도 같은 순간이 있다고 나는 믿는다.
제프 버클리(Jeff Buckley)의 ‘Grace’를 처음 들었을 때,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를 우연히 만났을 때, 안토니 앤 더 존슨스(Antony & The Johnsons)의 ‘Hope There’s Someone’을 들으며 어두운 방구석에서 혼자 흐느꼈을 때, 구원과도 같은 그 어떤 순간은 벼락처럼 내게 찾아왔다. 그 벼락같은 순간을, 나는 오늘도 기다린다. 수프얀 스티븐스(Sufjan Stevens)의 2015년 신작 [Carrie & Lowell]처럼 위대한 음악은, 여전히 그 어디에선가 써지고 있으니까.
음악평론가·배철수의 음악캠프 작가
배순탁 '오늘 뭐 듣지' ▶ 시리즈 모아보기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