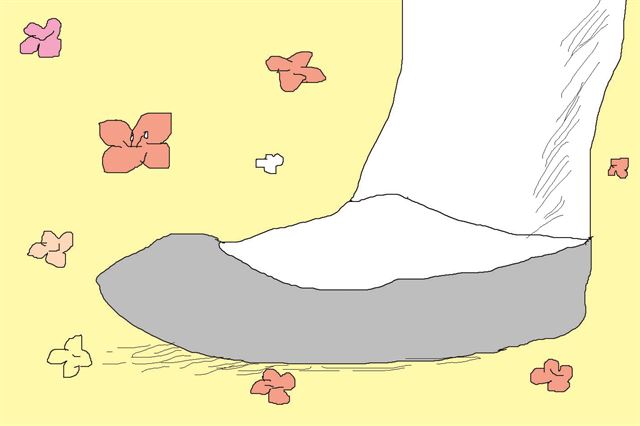
10여년 전 한 겨울에 길림성(吉林省) 성도(省都)인 북만주 장춘(長春)을 찾은 적이 있었다. 온 대지가 하얗게 물든 만주의 겨울은 꽤나 매서웠다. 그래서 ‘긴 봄’이라는 뜻의 장춘(長春)이란 이름에 관심이 갔다. 봄이 오래 머물기를 얼마나 바랐으면 그런 이름을 지었을까? 장춘의 유래를 찾아보니 원래는 숙신어(肅愼語) 다아충(茶?衝)이란 말에서 나왔다고 한다. 하늘에 제사를 지내면서 좋은 절기를 내려주기를 비는 뜻이라고 한다. 이런 말뜻이 점차 희도(喜都), 즉 기쁜 도읍지에 복을 비는 뜻으로 전환되었는데, 희도(喜都)를 한자로 적은 것이 장춘(長春)이라는 것이었다.
북경대 대리총장을 지냈던 중국의 역사학자 부사년(傅斯年ㆍ1896~1950)이 있는데, 장개석(蔣介石)의 국민당이 대만으로 퇴각한 후 국립 대만대 총장을 지냈다. 그는 ‘이하동서설(夷夏東西說)’이란 유명한 저서에서 “옛 숙신은 당연히 한(漢)나라 때의 (고)조선이다”라고 말했다. 그의 설명을 따르면 장춘은 숙신, 곧 고조선 선조들이 하늘에 좋은 절기를 내려달라고 비는 말이었다가 나중에 기쁜 도읍지라는 뜻으로 전환된 것이다. 장춘의 어원에 대해 장미(薔薇)의 별명이란 설명이 있는데 ‘만주지명고(滿洲地名考)’에 나오는 이야기다. 또한 ‘장춘현지(長春縣志)’에 따르면 장춘청(長春廳)을 설치한 지점이 장춘보(長春堡)에서 동쪽으로 몇 리 떨어진 곳이었기에 장춘이라고 이름 지었다는 말도 있다.
장춘은 또한 신선들이 마시는 신선주(神仙酒)를 뜻하기도 했다. 고려 후기 이규보가 박학사(朴學士)에게 차운(次韻)한 시 중에 “그대는 늘 긴 봄 속에 있으니/ 음양이 바뀌는 것이 아무 상관 없구나(君在長春境/ 陰陽任慘舒)”라는 구절이 있다. 이규보는 이 시를 설명하면서 ‘그대의 얼굴에는 늙은 티가 없었다’라면서 세속에서 초월한 신선처럼 평가했다. 조선시대는 궁전의 이름을 대부분 유학의 이념을 따라서 지었지만 고려 때는 조금 달랐다. 그래서 고려 궁전의 전각 중에는 장춘전(長春殿)이 있었다고 ‘고려사절요’는 설명하고 있다. 다만 조선에서도 창덕궁 동쪽 담장문의 이름이 경양문(景陽門)이었는데, 새 대문은 장춘문(長春門)이라고 지었다는 기록이 ‘국조보감(國朝寶鑑)’에 나온다. 그만큼 봄이 오기를 바라고 온 봄이 길기를 바라는 마음은 한결 같았다.
그런 마음들이 싯구로 표현된 것이 연화풍(?花風)에 대한 것이다. 음력 초봄부터 초여름까지 5일에 한 번씩 새로운 꽃이 피는 것을 알려주는 바람이 번풍(番風)인데, 이를 ‘꽃소식 바람’이란 뜻에서 화신풍(花信風)이라고도 한다. 화신풍이 24번 부는데 매화풍(梅花風)이 가장 이르고, 연화풍이 가장 늦다. 연화풍은 24절기 중 청명(淸明)과 입하(立夏) 사이의 곡우(穀雨)에 부는 바람으로 양력 4월 20~21일경이 되는데, 이 바람이 불면 봄이 가고 여름이 온다는 것이다.
정약용이 강진 유배 시절 지은 ‘산행잡구(山行雜謳)’에 이 시어를 썼다. 정약용은 “봄을 붙잡아둘 계교 없으니/ 오는 여름 맞이할 수밖에/ 알겠다, 승려들의 집이 좋겠구나/ 산 속에 정자와 누대가 있으니(無計留春住/ 何如迎夏來/ 也知僧院好/ 山裏有亭臺)”라고 노래하고 이어서 이렇게 읊었다. “언덕, 산 여기저기 동백나무들/ 늦게 남은 붉은 꽃잎에 시선 멈추네/ 어찌 하면 비단장막 가져다가/ 연화풍을 감추고 끊으랴(夾岸山茶樹/ 猶殘?晩紅/ 那將錦步障/ 遮截?花風)” 연화풍을 감춰서라도 봄을 더 잡고 싶은 마음을 노래한 것이다. 조선 초기 서거정(徐居正ㆍ1420~1488)도 ‘봄날의 감회(春懷)’라는 시에서 “늙으니 봄이 더디길 바라지만 더디질 않네/ 깨서 읊다 보니 또 답청 때가 되었구나(老願春遲春不遲/ 醒吟又逼踏靑時)”라고 노래했다. 음력 삼월삼일에 야외에 나가서 파랗게 난 풀을 밟으며 산책하는 것이 답청이다. 이 시에서 서거정은 “스스로 웃노라. 내 전생이 두릉 노인이었는지(自笑前身杜陵老)”라고 읊었는데, 두릉 노인은 당나라 시성(詩聖) 두보를 뜻한다.
두보는 ‘지는 꽃이 아쉬워’라는 뜻의 ‘가석(可惜)’에서 “꽃잎은 무엇이 급해 저리 빨리 날리는가, 늙어가니 봄이 더디기를 바라는데/ 안타깝구나 기쁘게 즐기는 곳, 어디 가도 젊은 때는 이미 아니네(花飛有底急, 老去願春遲/ 可惜歡娛地, 都非少壯時)”라고 읊었다. 가는 봄이 아쉬운 것은 우리 옛 선조나 시성 두보나 우리들이나 마찬가지다. 별로 마음 둘 곳 없는 시대이기에 가는 봄이 더욱 아쉬웠는지도 모른다.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