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국회의원이자 대형 건설사 회장이었던 성완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치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자신의 치부가 담긴 메모와 증언을 상세하게 남겼다. 사태 초기 적잖은 국민들이 미니시리즈의 마지막 회가 눈 앞에 펼쳐지리라고 기대했을 터이다.
하지만 지금은 관련자들이 모조리 구속되고 적폐가 청산되는 일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다. N스크린 시대 수천만 개의 화면에서 육필 메모와 육성 증언이 재생되고 있지만, 증거의 법적 구속력으로부터 공소시효, 10년 전 정권에서 일어났던 일에 이르기까지 망인의 의지를 가로막는 요인들만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사회학자가 사회적 사건을 관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당사자들의 관계와 그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이익의 정체이다. 메모에 등장한 유력 정치인들과 성완종의 관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사회적 배경의 이질성이다. 혹자는 성완종이 사회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뒷배를 지탱해줄 학맥과 혼맥을 쌓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사실 총리를 제외하고 메모에 이름을 올린 이들은 비충청권 태생의 명문대, 고시 출신들이다. 성완종과 이들의 사회적 거리를 감안하면 과연 망인이 위기의 순간에 진정한 ‘의리와 신뢰’를 기대할 수 있었겠느냐는 생각이 든다. 오히려 ‘부패와의 전쟁’ 같은, 정치적인 사정 과정에서 성완종은 버리기 좋은 패였을 수도 있다.
하지만 복마전 같은 건설시장에서 대기업을 일군 성완종이 돈의 힘에만 의지했다고 보는 건 너무 단순해 보인다. 당사자들이야 대단한 일이 아니었다고 부인하지만, 그는 자살 전날 전직 야당 대표와 냉면을 먹었고, 한때는 차기 대선과 관련하여 신DJP 연합을 타진했다고도 한다. 그리고 종편에 나와 그의 결백과 순수함을 호소하는 ‘지역 인사’들을 보자면 그에게 의리와 신뢰를 지키는 기반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성완종은 갈등하는 세력들 사이에서 의사소통과 이해관계를 조절함으로써 이익을 챙기는 ‘브로커’가 되려고 했던 것 같다. 중세 유럽 사회에서 브로커는 이방인들이 생존하기 적당한 전략이었다. 처음부터 어떤 세력에도 속하기 어려웠던 유대인들이 중간거래인(middleman)을 도맡아 부를 축적했던 것이 그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성완종은 왜 실패했는가? 성공적인 브로커는 자신의 위치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영한다. 사실 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일정한 사회적 자산이 있어서 최소한 타인의 시선을 끌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자신이 거래할 사람의 자질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초대 국정원장을 지낸 이종찬이 그런 사람이다. 그는 1980년 중앙정보부 간부로서 민정당 창당에 관여하는 와중에서도 수배자였던 조영래의 사법연수원 복교를 도왔다. 이후 그가 서울 종로에서 내리 7선을 하는 동안 당적은 민정당에서 새천년민주당으로 바뀌었다. 물론 생전의 조영래가 이종찬의 정치적 변신을 도왔거나 도와줄 능력이 있었을 리 없다. 하지만 이로 인해 김대중과의 거리가 좀 더 가까워졌을 가능성이 있다.
훗날 좀 더 정확한 평가가 나오겠지만 성완종은 정치적 후원 관계를 자기 회사의 영업을 위해 바로 바로 이용했던 것 같다. 금융계 반응을 전한 소식들에 따르면 경남기업이 정치권이나 금융당국을 내세워 선을 넘기 시작한 건 꽤 오래된 일이다. 사회적 관계는 축적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적 ‘자본’이라고 부른다. 이해가 상대의 눈에 포착되는 순간 자본은 순식간에 소진되고 관계는 허약해진다. 브로커는 이 같은 관계의 쇠퇴에 특히 허약하다.
그는 자서전에서 “먼저 주고 나중에 받되 ‘줄 때는 겸손하게 받을 때는 당당하게’ 이것이 내 기브 앤드 테이크의 원칙”이라고 썼다. 그는 시장의 이권을 거래할 때 가질 법한 생각을 정치의 세계로 가지고 갔던 것 같다. 그가 정치의 세계에서 만든 인연은 살찌지 못하고 가난해져만 갔다. 그리고 그 가난한 인연의 기억을 메모지에 남기고 절대 변치 않을 인연, 어머니의 곁으로 갔다.
이원재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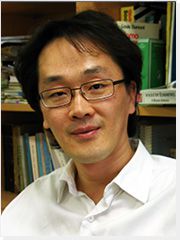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