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길어지고 들녘에는 한창 올 농사가 시작되었는데 우연히 꼽아보니 음력으로는 아직 이월 중순이다. 작년에 윤달이 들어서 한참 뒤에 따라오는 게다. 음력 이월에는 재미있는 속담이 있다. 이월은 썩은 새끼줄에 목을 매다는 달이라는 속담이다. 이 말을 듣고 곧바로 뜻을 새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월이 지나면 본격적인 농사철이고 기계화가 되지 않았던 예전에는 농사일이 곧 죽음과도 같은 고역이었다. 농사 시작되는 것이 범의 아가리에 들어가는 것처럼 무서운데 그렇다고 진짜 죽을 수는 없어서 그 괴로운 마음을 썩은 새끼줄에 목을 매고 싶다고 한 우리네 농투성이들의 표현이었다. 예나 지금이나 농사일은 고달프고 힘에 부친다. 귀농한 지 이십 년이 넘어가는 데도 여전히 농사철이 시작되면 한 해가 9만리처럼 느껴진다. 아직 진짜 농사꾼이 되지 못한 탓도 있지만 풍년 농사를 지어본들 살림살이의 셈 평이 펴지지 않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눈에 보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도 마음은 바쁘고 꽃 몽우리를 터트리려는 사과나무, 복숭아나무를 보면 온종일 과수원을 떠날 수가 없다.
한창 바쁜 사월에 부산함을 더해주는 게 또 있다. 서울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고향에 발붙이고 사는 이들에게 더 극성인 것이 있으니 해마다 이맘때 열리는 동문체육대회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줄곧 지역에서 다닌 나 같은 사람에게는 하루에도 몇 번씩 문자며 전화가 온다. 한 번은 친구가 전화를 해서 초등학교 동창들끼리 밴드를 하는데 거기에 가입을 하라는 것이었다. 도무지 요령부득의 소리라서 되묻기를 이 나이에 무슨 밴드냐, 나는 악기라고는 아무것도 다루지 못하는데 무슨 밴드에 가입을 하느냐, 했다가 봉변에 가까운 홍소를 듣기도 했다. 이거야 원, 소설가 김성동 선생의 진단처럼 농본주의에서 자본주의를 거쳐 컴본주의 세상이 된 게 틀림없지 않은가.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속에 젬병인 나로서는 이제 이 시대와의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검은 강물이 가로놓인 것만 같다. 하여튼 나이가 들면서 출신학교에 대한 애정이 새록새록 더 피어나는지, 아니면 어린 시절 운동회에서 일등을 놓친 한을 풀고 싶은지 갈수록 극성스럽다.
사실 20대 초반에 어느 강연을 듣고 결심한 게 하나 있다. 우리 사회의 이런저런 병폐를 거론하면서 학연, 지연, 혈연으로 뭉치는 문화가 그 병통의 큰 줄기라는 요지의 강연은 꽤나 나를 감복시켰고 그 후로 나는 그 세 가지로 엮이는 모임에는 일절 나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동문회, 향우회, 종친회 따위에 나가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대개 그 세 가지로 엮이는 고로 그 원칙을 지키는 데는 조금의 외로움을 감수해야 했다. 그래도 삼십 년 가까이 마음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여전히 내게도 줄기차게 연락이 오는 것이다. 나도 옛 친구들이 보고 싶고 학교 다닐 때의 추억을 안주 삼아 술 한 잔 기울이는 즐거움을 어찌 모르랴. 하지만 먹고 마시고 노래 부르는 행사 한 번에 기천 만원이 든다는 그런 동문체육대회에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더구나 작년부터 사월은 또 다른 의미가 되지 않았던가.
세월호 참사로 자식을 잃은 부모님 몇 분을 만난 적이 있다. 기록을 남기려는 목적으로 몇 시간씩 인터뷰를 했던 것인데 글을 쓰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취재였다. 함께 눈물 흘리고 분노하며 그 분들의 가늠 못 할 슬픔이 내게도 전이되어 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이상한 말이지만 그분들을 만날수록 나 스스로 조금이나마 정화되고 있다는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세월호 1주기, 어쩌면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제노비스 신드롬(목격자가 많을수록 개인의 책임감이 적어져 방관하는 심리현상)에 둘러싸인 것은 아닌지 물어야겠다. 그리고 마음으로나마 아픔을 나누지 않는다면 저 수런거리며 피어나는 사월의 꽃들에게 부끄럽지 않을까. 나는 정녕 부끄러울 것 같다.
최용탁 소설가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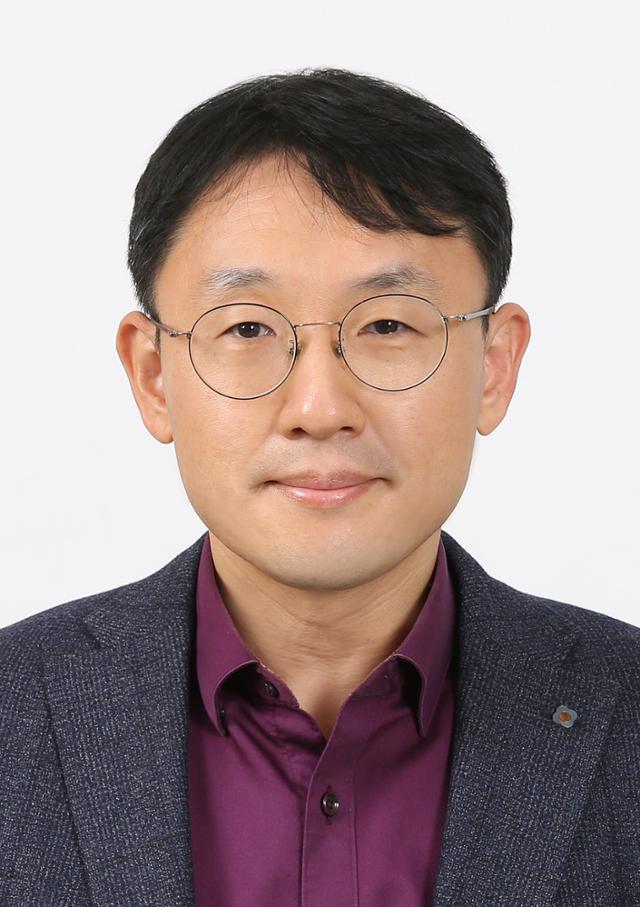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