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어느 굴다리 밑의 막걸리 집 벽에 새마을금고 달력이 있었다. 지인들과 막걸리 마시다가 다음 달 스케줄 확인 하려고 달력을 들추었다. 4월. 엘리엇의 시 그대로 잔인하고 가슴 찢어지는 달 아닌가. 이 4월의 30일 중에 저절로 눈이 가는 날. 16일. 죽어도 잊을 수 없는 날. 세월호가 304명의 목숨을 붙들고 바다 속으로 들어가 버린 날. 250명의 단원고 학생과 11명의 교사가 목숨을 잃은 날. 그런데 이 4월 16일 아래 느닷없이, 이런 문구가 버젓이 쓰여 있었다. ‘국민 안전의 날’.
이건 또 뭔가, 국민 안전의 날이라니. 이 참혹한 날에 국민의 안전이라는 문자를 박아 놓다니…. 우리는 기가 막혀 한동안 말도 못한 채 그것을 들여다보기만 했다. 안전이라는 말이 이렇게 사람을 놀라게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 더 놀랐다.
하여 기록들을 들추어보니 지난 2014년 5월 19일 대통령 담화 때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추모비를 건립하고, 4월 16일을 국민 안전의 날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고 나온다. 제안했다고 하니 실제로 그 날이 지정이 되었는지 아닌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바로 옆에 매달려 있는 요식업업체연합에서 나온 달력에는 없었으니.
워낙 대형 참사인데다가 실종자 수색과 구조가 먼저이다 보니 대통령 담화의 일부분이 우리들 기억에서 사라져버린 것이다. 담화의 전체 내용도 별다른 것 없이, 누가 대통령인들 할 수 있는 말이 대부분이었다. 물론 ‘해경 해체’는 약간 충격적이긴 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충격요법으로 받아들여졌다. 뭔가 결단을 내렸다는 뉘앙스 말이다.
해경 조직을 해체한다고 해서 그들 모두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는가. 이름만 바꾸고 역할은 그대로 존속될 것이다. 지난 1990년 윤석양 이병에 의해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이 폭로 되었을 때 난리가 났었다.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하라고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나왔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 보안사가 기무사로 이름만 바꾸었을 뿐이다.
문제는 대통령이 스스로 약속한대로 행동했느냐이다.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찾아내 처벌하고 또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무엇으로 바꾸어서 유가족들의 한을 풀어주겠다는 그의 말은 허공으로 사라졌다. 고작 123정장한테 구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운 것 밖에 없다.
아니, 있기는 하다. 유가족을 미행, 사찰했다. 유가족과 그들의 슬픔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조직적으로 달려들어 저질의 비아냥거림과 조롱을 던지는 잔인함을 보여주었다. 면담요청도 안 들린 척하고 특별법 만들면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기소권은 그냥 두고라도 수사권마저 주지 않으려고 목숨 걸고 애를 썼다. 심지어 언딘과 해경의 유착도 제대로 밝혀내지 않았다. 어디에서 추모의 증거를 찾을 수 있겠는가. 이런 행태들은 대통령과 정부가 세월호 사건과 유가족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는지 그 정서와 태도를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 안전의 날이다.
이건 마치 힘 센 사람이 약한 사람 때려놓고 나서 사람을 때리는 짓은 나쁜 짓이라고 설교하는 것과 같지 않은가. 그래서 안전의 느낌이 깎아놓은 손톱 조각만큼도 실감나지 않는다. 그저 정부의 홍보 문구가 되어버린 것. 이 중요한 단어가 이렇게 오염되어버렸다. 하긴, 우린 오랫동안 말(語), 말로만 채우고 때우는 플래카드 정치를 보면서 살아왔다.
갑자기 떠오른 70년대 유머. 식목일이 있는데도 우리나라 산이 헐 벗는 이유는? 나머지 날은 모두 잡아 뽑고 베는 날로 여기기 때문이란다. 안전이라는 말을 이 따위로 써먹게 된다면 앞으로 계속 제2, 제3 안전의 날들이 생길 것이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의 날’로 달력에 박아 넣어야 한다. 있는 그대로.
한창훈 소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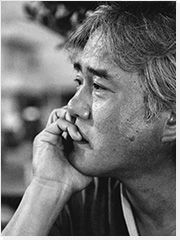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