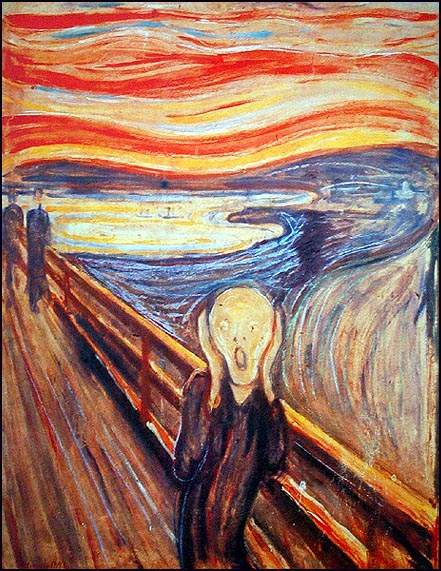
지금보다 더 나은 사회 시스템을 꿈꾼다. 그러나 거대담론에만 함몰돼서는 안 된다. 일상에서의 소소한 행복도 챙겨야 한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돈으로 자신을 포장하려는 의식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중요하다. 돈 안 들이고 즐길 수 있는 것을 찾아 취향을 공유하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자는 주장을 이 지면에서도 여러 번 말했다. 스스로도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있다. 이런 삶의 방식과 태도를 굳이 함축하자면, 그래 ‘달관’이라 말할 수도 있겠다.
한 신문에서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진 젊은 사람의 사례를 나열한 뒤 ‘달관세대’라 묶는 기사를 썼다. 스스로 가지고 있던 방식과 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룬 기사를 보니 기분 나쁜 위화감이 들었다. 기사에서 언급된 “그들은 풍요로운 시대에 태어난 덕에 돈 없어도 재미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많다고 말한다”와 같은 대목은 클리셰다. 풍요로운 시대에 태어난 것을 고맙게 여기며 군소리(라고 쓰고 ‘체제 비판적 언행’이라 읽는다)하지 말라는 거다.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정보는 단편적이다. 예를 들어, 기사는 월세 비용만 말할 뿐 보증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다. 각종 세금, 보험료, 채무 상황 역시 언급되지 않는 건 마찬가지다. 이런 라이프스타일이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걱정해주지 않는다. 그들이 걱정하는 것은 오직 경제성장뿐이다. (관련내용 ▶ 검색으로 보기)
나는 아직 부모님과 함께 산다. 주거비를 아낄 수 있다. 생계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기에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수 있는 운 좋은 케이스다. 그런 나도 미래를 생각하면 막막하다. 불안과 유동성이 높아진 시대, 정부는 손 놓고만 있는 것 같다. 대기업과 부동산 부자에 거둬들이는 세금은 오히려 줄었고, ‘서민 증세’는 줄을 이었다.
세금이 는 만큼 복지 혜택으로 돌아오는 것도 아니다. 대학에 가기 위해, 집을 마련하기 위해 거액의 빚을 져야 한다. 노후나 질병에 대해 생각하면 공포를 느낀다. 투병에 큰 비용이 드는 병에 걸리면 그냥 죽어야겠다고 생각한다. 달관이라면 달관이다. 너무 높은 주거비 때문에 최악의 경우 노숙자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차악은 (받아만 준다면)마당 쓸고 잡일하며 절에 머무는 것이다. 그럼 달관을 넘어 열반에 들 수도….
‘달관세대’라는 말은 일본의 ‘사토리(さとり·깨달음)세대’를 따라 붙인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에 비해 고용이 안정돼 있고, 최저임금이 높다. 초고령화 사회라 문제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공공복지도 한국보다 나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기에 일본의 ‘사토리’에서는 (비교적)행복의 기운이 느껴진다. 반면 한국의 달관에는 무기력과 체념이 더 강하다.

최근 ‘달관세대’ 기사는 이 같은 차이를 외면한 것이다. 정부· 여당· 재벌 등 기득권에 유리하게 이슈몰이를 해온 그 신문의 행보가 떠오르며 기사에서 불순함을 느낀다. 한국청년들이 주어진 환경에서 어떻게든 즐겨보고자 하는 ‘정신승리’를 멋들어진 트렌드인 양 포장한 보도를 보고, 아마도 속으로 가장 흐뭇해 했을 사람은 기득권층이 아닐까.
지금 한국사회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달관이 필요한 사람은 기득권층이 필요하다. ‘달관세대’가 하는 정도의 달관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죽음에 대해 달관하라는 것도 아니다. 그저 소유에 대한 욕심을 조금 줄여달라는 것이다. 한국에 사는 80%의 사람들에게 삐끗하면 추락해 맞닥뜨릴 ‘삶의 바닥’은 무저갱이다.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정부와 기업이 그렇게 바라는 ‘경제성장’과도 관련 있다. 국민들의 삶의 불안감을 완화시키면 소비가 늘어나고 패기 있는 도전을 북돋을 것이며 출산율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기득권층의 푼돈이 서민들에게는 동아줄이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사회 시스템을 꿈꾼다. 이것만큼은 나도 도저히 달관할 수 없다.
최서윤 월간잉여 발행ㆍ편집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