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푹한 날이 계속되다 얼마 전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렸다. 아직 겨울이 다 갔다고 하기엔 이르고 이월 바람에 장독 깨진다는 속담 대로 비 그치고 다시 추위가 몰려온 듯도 하다. 그래도 가만히 맡아보면 찬바람 속에 옅은 봄기운이 느껴진다. 어느 시구처럼 봄은 멀리서 이기고 오는 중이다.
잠시 과수원을 둘러본다. 겨울 전정을 끝낸 사과나무, 복숭아나무는 아직 깨어날 기미가 없는데 지난해 심은 매실나무들은 벌써 연초록 꽃눈이 부풀어 올랐다. 설중매라더니, 과연 겨울 속에서도 눈을 틔우는 매서운 꽃이다. 천천히 걷다 보니 마른 풀만 사위어가던 땅 위에 점점이 자줏빛 모양이 눈에 띈다. 햇살이 잘 드는 양지쪽에서 올라오는 그것은 냉이다.
여러해살이 식물인 냉이는 겨울에 말랐던 이파리 가운데에서 자주색으로 새순을 내민다. 아직 초록 잎으로 퍼지기 전인 이맘때 캐어서 끓이는 냉잇국이 제일 맛있다. 나는 횡재라도 만난 양 당장 호미를 챙겨와 냉이를 캐기 시작한다. 산그늘이 깊은 곳은 아직 언 땅이 녹지도 않았는데 쪼그려 앉아 호미질을 하다 보니 냉이가 지천이다. 서서 보는 것과 앉아서 보는 게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 땅에 몸을 대고 눈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흙과 이어진 자신을 발견한다.
금세 냉이국거리를 캐고 내친 김에 마을을 한 바퀴 멀리 돌아본다. 우리 마을은 논이 많고 이모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들녘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농로를 따라가는 호젓한 산책길, 멀리 논 가운데 트랙터가 돌아다니고 있다. 그래도 논을 갈 때가 아닌데, 갸웃하며 살펴보니 소먹이용으로 갈무리 해놓은 볏짚 덩어리를 옮기는 중이다. 하얀 비닐로 싼 커다란 볏짚덩이를 보고 도시에서만 산 어느 아이가 그랬다지. ‘저거 봐. 저기가 마시멜로 밭인가 봐.’
올해도 논에 흙을 받은 곳이 두 군데 늘었다. 쌀값이 형편없이 떨어져서 생산비가 나오지 않으니까 논을 밭으로 바꾸는 것이다. 벌써 그렇게 바뀐 논배미가 여남은 필지가 넘는다. 그곳에 비닐하우스를 지어 시설농사를 하거나 고추, 콩, 옥수수 등속의 잡곡 농사를 짓는다. 논을 밭으로 바꾸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했던 게 불과 몇 년 전인데 이제 정부에서 권장하는 바가 되었다.
이제 우리 땅에서 나오는 쌀만으로는 자급자족이 되지 않는데 논은 점점 줄어든다. 그렇다면 쌀값이 올라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계속 떨어지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올해부터 완전히 수입이 자유화된 쌀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가 없다. 높은 관세율로 장벽을 쳤다고 하지만 농민들은 불안하다.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다는 휴대폰이니, 자동차 같은 수출품을 꼬투리 삼아 관세율 재조정을 요구한다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여전히 수출만이 살 길이라는 신화가 건재한 터에 쌀쯤은, 농민들쯤은 간단히 버림받지 않을까. 봄이 오는 들녘에는 스산한 불안이 배어있다.
봄은 역시 사람에게, 농민들에게 먼저 온다. 마을회관에 모여 겨울을 난 나이 든 농부들의 엉덩이가 들썩인다. 해토머리가 되면 별반 할 일도 없건만 진득하게 앉아 있지 못한다. 괜스레 논밭을 둘러보고 경운기도 탈탈, 시동을 걸어보고 먼저 풀린 텃밭에 삽이라도 꽂아보는 것이다. 한 해 농사지어서 제 품삯 나오는 작물이 아예 없어진 게 이미 몇 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날이 풀리면 어쩔 수 없이 다시 농사 준비를 한다.
계산속이 없어서도 아니고 미련해서도 아니다. 따져보고 셈을 놓던 사람들은 이미 농촌을 떠난 지 오래다. 아이 울음이 사라진 농촌을 지키고 올 한 해 또 농사를 준비하는 마음은, 애처롭지만 남은 삶을 온전히 거두기 위해서다. 농업도 창조경제로 하고 6차 산업이 되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지만, 다만 스러져가는 저 늙은 농부들의 존재증명 또한 그대로 아름다운 이 시대의 아픔이리라.
우수 지나고 경칩이 내일모레다. 모래알처럼 많은 풀과 나무들 하나하나에 물이 오르고 발 밑에 녹은 흙이 들러붙을 때, 잠시 기억하자. 그렇게 봄은 깊은 곳에서부터 물이 되어 온다는 것을, 때로 그것이 눈물이라는 것을.
최용탁 소설가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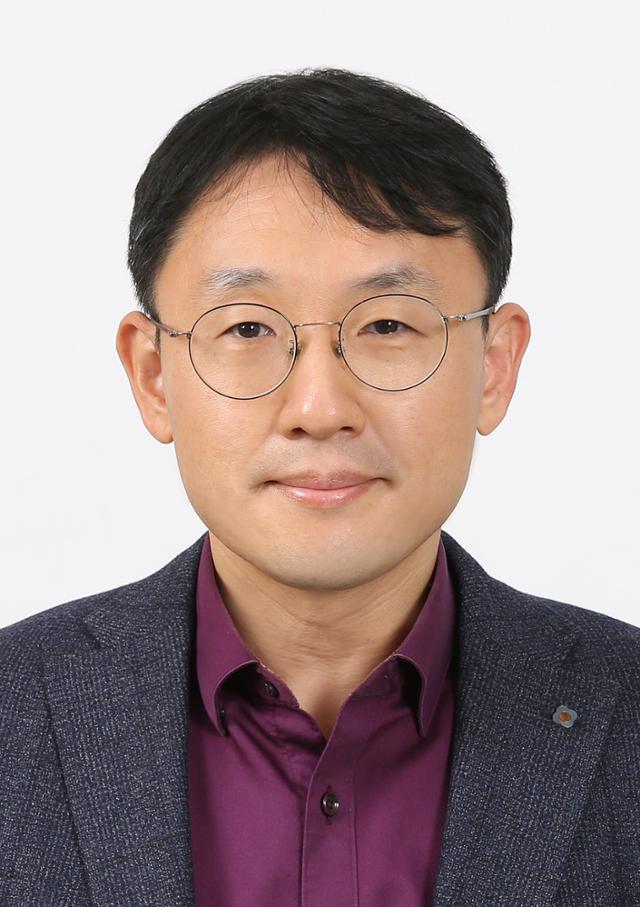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