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한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나라라는 상찬에 익숙하다. 지난 날 십수년을 이어온 두 자릿수 경제성장률과, 거리를 가득 메운 시민들이 무려 헌법 개정을 이뤄낸 것은 지금은 언감생심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더군다나 2차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다른 신생국들에 비추어 본다면 이런 자부심이 그다지 과해 보이지도 않는다.
최근엔 이같은 자부심을 근거로 산업화, 민주화 세력들 사이의 화해와 존중을 호소하는 목소리들이 높다. 갈등하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소통이 나쁘다고 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이들은 사실상 산업화-민주화의 두 가지 가치들을 기계적으로 병치시키고, 이를 통해 우리가 겪어냈던 역사의 구체적 기억들을 탈각시킨다는 점에서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구석이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역사의 정점에는 불확실한 해방 후 국제 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낸 초대 대통령과 국민의 총화단결을 불러 일으켜 경제 기적을 만든 대통령, 그리고 그 곁에서 고달픈 민중을 보듬어 주었던 영부인이 있다. 역사를 의인화함으로써 위인전 수준으로 단순화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소위 알아주는 국회의원과 도지사가 주도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과연 현실 정치인이 주도하는 역사기술이 복잡한 현실과 역사에 대한 숙고로 이어질 수 있을까? 사실상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소통과 존중이 아니라 “대한민국 부정론자와 유사 정치세력의 왜곡ㆍ선동에 맞서 국가 정체성을 지키라”는 것이다.
19세기 유럽의 눈부신 경제ㆍ정치 발전에 대한 당대 사상가들의 접근 방식은 사뭇 달랐다. 막스 베버와 에른스트 트뢸치의 역사 기술을 바탕으로 존 스튜어트 밀은 당시 중국과 유럽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중국은 위대한 사상과 정교한 정치 체제를 가졌으나 그 통합의 정도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정체될 수 밖에 없었다. 반면 유럽은 무수한 문화적 변종들이 갈등, 결합한 끝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밀에게 자본주의 국민국가란 위대한 지도자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다. 당시 유럽에 위대한 지도자가 없었다는 말이 아니다. 다만 지도자의 위대함이란 역사가 발전한 끝에 만들어낸 결과이지 그 원인이 아니라는 말이다.
한국의 산업화-민주화에 대한 찬사는 동아시아 경제 발전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비등했던 1990년 전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3년 세계은행이 펴낸 ‘동아시아의 기적’ 보고서는 이 같은 발전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시금석이었다. 이 보고서에서 언급된 동아시아 경제 성장의 요인들 중에는 “성장의 공유를 이끈 제도적 기반”이라는 것이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경제적 성과를 최대한 골고루 나눠 줌으로써 내부의 경쟁과 정부의 리더십을 함께 고양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정치적 외압을 받지 않고 경제발전계획을 수립, 실행할 수 있었던 경제기획원이나 정부와 시장을 긴밀히 연결시켜준 정부-경제인 회의 등이 “성장의 공유”에 기여했던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성장의 과실을 보다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민간에 분배했던 다른 나라들에 비해 한국에서는 이 같은 분배가 우연한 방식으로 이뤄졌다. 북한과의 경쟁이라는 국제정치적 요인, 노동과 민주화 운동이라는 국내 요인이 없었다면 한국에서 성장의 공유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긴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따라서 산업화와 민주화에 비슷한 값을 매기고 서로 다른 영역에서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가정하는 건, 역사와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오히려 방해만 될 뿐이다. 대한민국의 사회적 발전은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서로 다른 지향들이 갈등, 경쟁, 결합, 분열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특정 세력을 대표하는 명망가를 존경하는 것은 그 세력의 정치적 입지에 봉사할 뿐이지 우리의 미래를 정교하게 설계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광복 100주년에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세대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산업역군이나 민주투사와는 다른 새로운 사회적-역사적 정체성을 만들어주기 위해 숙고해야 할 때다.
이원재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사회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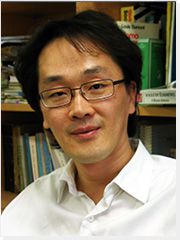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