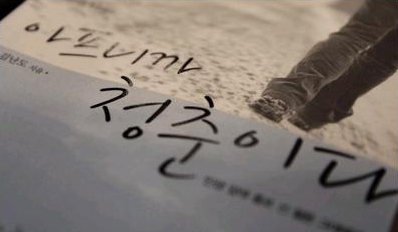
아이의 야구 사랑은 별났다. 좁은 집안에서 방망이를 휘둘러 TV 액정을 깨는가 하면, 구구단을 암기하기보다 응원하는 선수들의 타율을 외우고 다녔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매년 프로야구 스카우팅 리포트를 끼고 살더니 밥상머리에서도 글러브를 벗지 않는다. 이쯤 되면 부모는 머리가 복잡해진다. 아이의 장래 희망은 ‘물어볼 것도 없이 야구선수’라는 믿음이 앞서는가 하면, 한쪽에선 ‘그럼 공부는 어떻게 하지’라는 지극히 세속적인 걱정이 싹튼다. 그렇게 아이의 꿈을 되묻지 않은 시간이 2년 정도 흘렀고, 초등 4학년인 아이는 결국 지난달 지역 리틀 야구팀에 들어갔다. 공을 쫓아 달리는 게 장래 희망 때문인지, 아니면 부모의 욕심 탓인지 판단하긴 이르지만 어쨌든 아이는 주말이면 빠짐없이 차가운 강변 연습장을 뛴다.
나와 아내는 아이의 연습과 경기에 고스란히 주말을 바쳤다. 야구단이 모이는 곳까지 아이를 태워주고 일몰 전 다섯 시간 정도를 벤치에서 기다린다. 지루할 것도 같은 시간이지만 먼 발치에서 아이들을 지켜보는 내내 긴장은 풀리지 않는다. 나는 어쩌면 살아오며 한 번도 이들처럼 꿈을 위해 구체적으로 달려본 적이 없다는 생각에 먹먹해지는가 하면, 집에선 응석받이일 녀석들이 벌써 경쟁의 한 가운데로 내몰렸다는 안타까움도 쌓이는 시간이다. 아이들은 먼지를 한 주먹씩 삼키며 운동장을 돌고 나서야 유연하게 공을 던질 수 있다는 세상의 이치를 잘도 터득해내고 있다.
리틀 야구 코치들이 늘 강조하는 게 있다. ‘공이 어디에 있는지 항상 놓치지 말라’는 말이다. 모든 선수는 그라운드에 단 하나만 허용되는 공이 누구의 글러브로 향하고 있는지, 타구는 어느 방향으로 날아가는지 한시도 눈을 떼지 말아야 한다는 것. 안전을 위해서 하는 말이겠지만, 이는 야구공으로 치환된 경쟁 사회의 금언이기도 하다. 성공(승리)을 위해 목표(야구공)에서 눈을 떼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달려야)하는 세상(그라운드). 지금 공을 쫓는 아이들은 불과 수년 내에 20대로 성장하면 어김없이 부딪혀야 할 사회의 단면을 그라운드에서 목격하고 생존 방법을 습득하고 있는지 모른다. 이른바 20대를 위한 예행연습 중이라고나 할까.
요즘 송년모임에서 지인들과 모이면 너나 할 것 없이 치열했던 20대를 이야기한다. 선배들은 학생운동을, 나와 동년배는 IMF위기를 견뎌야 했던 고난의 20대를 떠올린다. 누구의 20대가 더 힘들었을까. 내기라도 하듯, 술자리 내내 50대와 40대들은 투옥과 정리해고의 경험과 목격담을 훈장처럼 늘어놓는다. “형들은 그나마 낭만이라도 있었잖아요.” 한껏 위축된 취업시장에 뛰어드느라 신산했던 청춘을 보낸 30대도 할 말은 많다.
그런데 말석에 앉은 20대 후배는 말이 없다. 그에게 20대는 추억이 아닌 그냥 차가운 현재다. 강남에서 10대를 보내고, 해외교환학생과 외국어실력, 그리고 명문대 졸업장의 스펙으로 똘똘 뭉쳤지만 그는 이른바 ‘이케아 세대’라 불리는 불운한 오늘의 20대다. 기능과 디자인이 뛰어나지만 언제라도 다른 제품과 대체 가능해 버려질 수 있는 스웨덴 가구브랜드 ‘이케아(IKEA)’와 닮았다 해서 붙은 이름. 추락할 바닥이라도 있었던 과거의 20대보다 이들은 더 힘들다. 고금리 시절의 부모세대가 그랬듯이 평생 월급을 절약하더라도 집 한 채 살 수 없는 현실, ‘인구론(인문계 졸업생 90%가 논다)’, ‘돌취생(입사 후 다시 취업 준비생으로 돌아온 사람)’ 등으로 자조해야 하는 취업전쟁이 20대의 숨을 차게 만든다. 훈련은 마쳤건만 뛰어들 경기장을 찾지 못한 2014년의 20대.
인생의 황금기인 20대를 꿈꾸며 저마다의 그라운드를 달리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말해주기 쉽지 않은 세상이다. 홈런을 쳐내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훈련보다 중요한 것-예를 들어 좋은 시대와 부모를 타고 태어나는 수동적인 운명-이 적지 않다는 엄혹한 진실을 아이들이 20대가 되기 전에 알아챌까 두렵다. 내일의 20대들이 어제의 20대들을 위해 어떤 짐을 나눠져야 할지 걱정이다. 하지만 어쩌랴, 그저 달릴 수밖에.

양홍주ㆍ경제부 차장대우 yangh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