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
도시의 쉼표, 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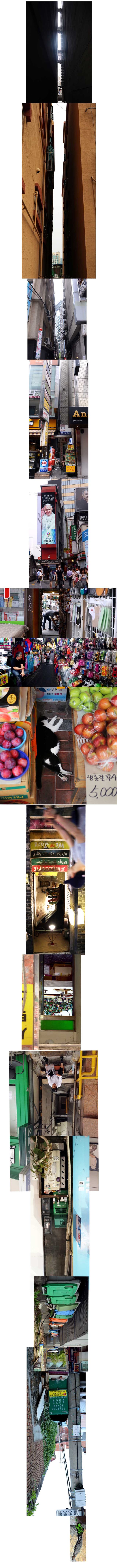
콘크리트 장벽이 빽빽하게 늘어선 도시, 숨막히는 회색 빌딩숲이 탐욕의 상징이라면 건물과 건물, 담과 담 사이의 가느다란 틈은 쉼의 공간이다. 내 것과 네 것 사이의 경계이면서 비움의 공간이 틈이다. 거대 도시를 지배하는 논리와 질서는 거리의 작은 틈새까지 미치지 못하기에 딱 떨어지는 하나의 의미로 ‘틈’을 규정짓기는 어렵다. 그저 작은 틈이 있어 도시가 숨을 쉬고 그 좁은 틈 속에서 서민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을 뿐.
무더위와 무료함에 지친 택시기사는 건물 사이 작은 틈새에 자리를 깔고 앉았다. 손님은 없어도 신문 읽기 딱 좋은 만큼만 드리워진 그늘이 만족스러운 눈치다. 벽과 벽 사이 쏙 들어간 공간은 넘치는‘금연’구호를 피하려는 애연가의 발길을 말없이 포용한다. 얼기설기 이어진 담장의 절묘한 틈새가 드넓은 창작의 장으로 변하기도 한다. 파란 백조의 미소에 잠시나마 눈길을 멈추는 것은 ‘여유’라고 부르는 마음 속의 틈이 있어서다. 늦은 밤 취객들이 ‘소변금지’와 마주치는 곳은 뒷골목의 으슥한 틈새다. 유동취객이 몰리는 목 좋은 틈새엔 아예 유흥업소 홍보 전단지도 붙어 있다.
국어사전은 틈을 ‘벌어져 사이가 난 자리’라고 설명한다. 사람 사이가 멀어져 틈이 생기면 되돌리기 어려운 것처럼 틈은 상실과 갈등을 의미하기도 한다. 건물 사이의 공간은 소유권을 따지기 곤란한 만큼 쓸모 있게 꾸미지 않는 게 보통이다. 애매한 틈새는 분쟁의 공간이 되기도 한다.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방치하거나 타인의 접근을 막기 위해 아예 막아버리기도 한다. 내가 가질 수 없다면 누구에게도 줄 수 없다는 이기심으로 인해 공간은 죽어간다.
누군가에게 쓸모 없는 공간이 다른 누군가에는 간절한 삶의 터전이 되기도 한다. 건물 사이 틈에 길이 나고 사람이 다니기 시작하면 좌판이 하나 둘 들어선다. 한 사람 겨우 다닐 만큼 비좁은 공간이지만, 할매들이 쥐어주는 덤이 커질수록 주부들의 발걸음은 늘어났다. 거들떠 보지 않던 틈새가 만남의 장이 되고 소통의 길이 된 것이다. 서울 구로구의 한 시장 이야기다.
지난 21일 남대문 시장 골목 한 켠을 30년 간 지켜온 오모(58)씨는 장사 잘 되느냐는 의례적인 인사에 웃음 띄며 대답했다. “그럼요, 잘 되죠” 번듯한 상점마다 손님 없다는 엄살이 흔한 요즘 뜻 밖의 대답이었다. 무거운 습기가 좀처럼 빠져나가질 않는 그 길고 좁은 틈새를 그는 낙원이라고 불렀다. “비록 한 평도 안 되는, 결코 소유할 수 없는 좁은 공간이지만 욕심을 비우니 마음 속에 누구보다 넓은 틈이 생겼다”고 말한다.
틈을 나와 도심을 걷다 보니 건물 사이 또 다른 틈들이 눈에 들어왔다. 틈은 쉼표다. 잠시 긴장을 풀고 숨 돌릴 틈을 찾아 천천히 발길을 옮겼다.

사진부 기획팀= 류효진기자 jsknight@hk.co.kr 박서강기자 pindropp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