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키건 지음ㆍ조행복 옮김
청어람미디어ㆍ639쪽ㆍ3만2,000원
1차 세계대전史의 결정판
평화에 대한 낙관과 정보 부족이 오판과 참화 부른 과정 상세히 서술
우크라 둘러싼 서유럽ㆍ러 힘겨루기
글로벌 금융위기 따른 유럽의 분열
현재의 국제정세 되돌아보게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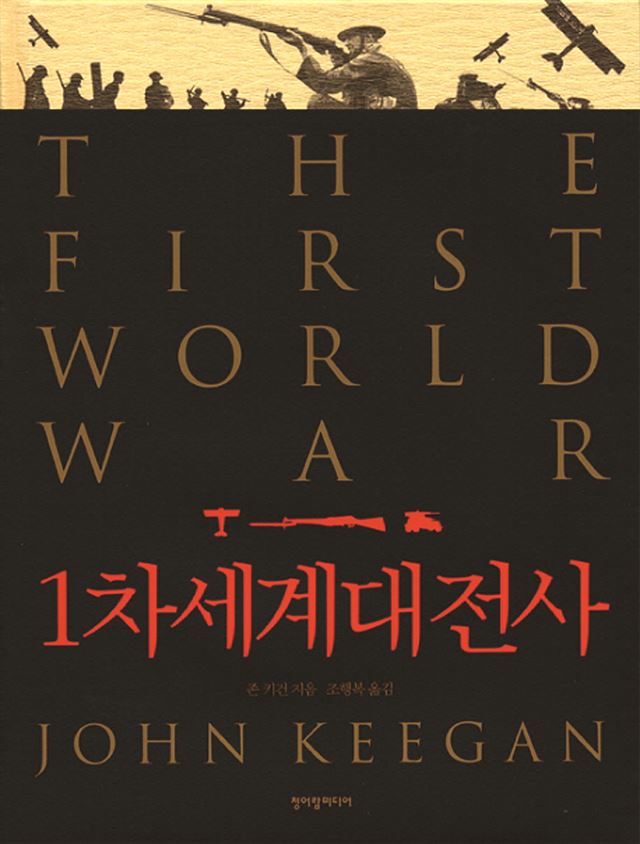

1914년 6월28일 보스니아 사라예보에서 총성이 울렸다.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쓰러졌다. 암살자는 세르비아계 19세 청년이었다. 오스트리아 황실은 경악했다. 배후로 세르비아가 지목됐다.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했다. 전쟁이 시작됐다. 세르비아의 후원자 역할을 하던 러시아가 참전했다. 오스트리아와 조약을 맺은 독일이 끼어들었고 프랑스와 영국, 오스만튀르크가 잇달아 합세했다. 1차 세계대전의 시작이었다. 전쟁이 군인들의 희생을 넘어 막대한 민간인 피해까지 낳을 수 있음을 알린 대참사였다.
제1차 세계대전은 꼭 100년 전 7월 28일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시작된 인류의 첫 세계대전이다. 이 역사적 사건이 인류에 미친 영향이 워낙 컸던 만큼 전쟁의 원인과 배경, 경과 그리고 교훈을 담은 책도 여럿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영국의 저명한 전쟁사학자 존 키건의 ‘1차 세계대전사’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 유럽 열강들의 역학 관계와 전황의 진행을 639쪽에 빼곡히 담았다. 평화에 대한 지나친 낙관과 가상 적국에 대한 불안이 어떻게 오판을 부르고 참화로 이어졌는지 서술한다.
책은 “1차 세계대전은 비극적이고 불필요한 전쟁이었다”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비극적이란 형용사는 수치로 환원된다. 1,000만명의 목숨이 지구에서 지워졌다. 세르비아의 경우 전체 인구(500만명)의 15%(72만명 가량)가 목숨을 잃었다. 인류 최초의 세계적 전쟁답게 막대한 희생이었다. 불필요한이란 수식은 당시 유럽 정세를 살피면 이해 가능하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 유럽은 평화에 젖었다. 전면전은 불가능하다 여겨졌다. 진부한 상식으로 통했다. 각국이 교류와 협력으로 매우 밀접히 연결돼 있었다. 전쟁은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그러나 전쟁에 대비하지 못했을 때 초래할 결과에 대한 두려움은 컸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는 자신들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고 느꼈다. 열강들은 무력 충돌을 피하기 위한 노력보다 군사력 확보에 더 역점을 뒀다. 열강 중 위상이 가장 낮았던 오스트리아가 특히 난처한 입장이었다. 슬라브 민족이 영토 안에 대거 거주하고 있어서다. 호전적인 세르비아족이 불안 요소였다.
사라예보 암살 이후 한 달이 지나 전쟁이 시작됐다. 거대 전쟁의 빌미가 됐던 사건 뒤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개전한 사실은 1차 세계대전의 실체를 함축한다. 오스트리아는 황태자의 죽음 뒤 강경 자세를 보였다. 하지만 오스트리아는 독일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시간을 허비한다. 최악의 경우 러시아가 세르비아를 도울지 모른다는 우려에서였다. 오스트리아가 독일과 접촉하며 뜸을 들이는 동안 전쟁의 불안감은 조금씩 덩치를 키웠다. 키건은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즉각 최후통첩을 보냈으면 세르비아는 바로 두 손 들고 전쟁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개전 직전 한 달 동안 각국 지도자들이 보인 행동을 보아도 전쟁의 먹구름은 엷었다. 독일 황제는 오스트리아 대사의 지원 요청 방문을 받은 뒤 노르웨이로 요트여행을 떠났다. 세르비아 총리는 오스트리아의 최후통첩을 받기 전 시골로 향했다. 러시아가 총동원령을 내렸다가 부분동원령으로 번복한 뒤 다시 총동원령을 내리며 오락가락하자 불신은 불안으로 변질됐다. 독일은 프랑스와 러시아에 전쟁 불가피를 통보했고 열강들의 연쇄개입이 이어졌다.
‘누가 빠졌습니까? 당신입니까?’(Who’s Absent? Is It You?), ‘아버지, 아버지는 대전 중에 무엇을 하셨나요?’(Daddy, What Did You Do in the Great War?) 1차 세계대전 중 영국 정부가 모병을 위해 내건 표어들이다. 참전을 신성한 의무로 강조했으나 1차 세계대전은 죽은 자와 다친 자들에게 어떤 영광도 안기지 못했다. 열강들도 그들의 화력을 시험하고 상대방에 대한 불신만 키웠을 뿐 별 이득을 가져가지 못했다. 1차 세계대전은 “유럽의 합리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계몽된 문명을 훼손하여 영구히 악화”시킨 전쟁이었다.
지금 세계는 지구촌이라 불릴 만큼 더 상호의존적이다. 누군가의 파멸이 나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커졌다. 그렇다고 국제전은 유물이 된 것이라 장담할 수 있을까. ‘1차 세계대전사’는 묻는다. 유럽을 초토화했던 대전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고.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유럽의 분열은 회의감을 던진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서유럽과 러시아의 힘겨루기도 예사롭지 않다. 대전쟁은 평화에 대한 낙관과 서로에 대한 정보 부족 속에서 예기치 않게 벌어진다. ‘1차 세계대전사’가 전하는 교훈이다.
라제기기자 wender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