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숲은 생각한다’는 시적인 느낌이 드는 말랑한 제목에다, 앙리 루소의 환상적인 그림 ‘꿈’을 버무려둔 표지를 보고 섣불리 달려들었다가 코가 깨질 수도 있는 책이다. 인류학자인 저자가 1996년부터 4년간 남미 에콰도르 동부 아마존 유역에서 아빌라 마을을 탐사한 뒤 2013년 내놓은 이 책은, 이 세상을 하나의 온전한 전체로 파악하려는 ‘홀리즘(Holism)’의 관점을 취하고 있다. 생각을 인간만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듯 숲도 하며, 인간과 숲의 생각을 모두 합쳐야 온전한 이 세상 모습이며, 그렇기에 인간은 숲의 생각을 읽어내야 하는 존재임을 드러내는 제목은 여기서 나왔다.

그런데 전체론적 접근법을 취하기 위해 저자가 꺼내든 이론가가 바로 찰스 샌더스 퍼스(1839~1914)라는 점이 이채롭다. 기호학자 김성도(고려대)가 ‘훌륭한 기호학 이론가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프래그머티즘, 심지어는 미국식 실용주의 철학자로만 알려져 있다’라고 안타까워했던 그 퍼스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 또한 서문에서 자신의 방법론을 소개하면서 “언어인류학자 알레한드로 파스가 ‘기괴한 퍼스’라 칭한 것을 불러들이고자 한다”라고 하는 걸 봐서는, 그리고 2014년 이 책에 미국인류학회가 상을 준 것을 보면, 퍼스를 선택한 저자의 접근법이 서구에서도 이색적인 것 같다.
이 때문에 번역자와 출판사는 이 책의 번역 출간 의미를 최근 인류학계에서 각광받고 있는 ‘존재론적 전회(Ontological Turn)’라는 점에서 찾지만, 그건 전문가들 사이에서 흥미로울 주제일 것 같고, 일반 독자들에겐 흔히 봐왔던 유럽 쪽 기호학이 아니라 퍼스의 기호학이 실제 사례에 어떻게 적용되는 지 따라가보는 재미가 클 것 같다. 물론, 책을 덮은 뒤 ‘존재론적 전회’가 어렴풋이 떠오르는 것까지 막진 않는다.

기호학하면 흔히 떠오르는 건 ‘시니피앙(기표)’과 ‘시니피에(기의)’의 구분이다. 기표와 기의의 관계는 자의적이며, 이 구조를 정교하고도 높다랗게 짜맞춰 쌓아 올린 것이 이 세계이고, 따라서 이 언어 구조 바깥의 세상은 없다고 한다. 문제는, 이렇게 하면 기호학은 인간만의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퍼스는 그보다는 이 세상 자체를, 그러니까 인간뿐 아니라 동식물도 자기 나름의 기호를 발산하는, 그 자체가 기호인 세계라 봤다. 기호를 도상(아이콘)ㆍ지표(인덱스)ㆍ상징(심벌)로 나누고, 기호작용(세미오시스ㆍSemiosis)을 대상과 기호와 해석체간 삼각 관계로 풀어내는 등 색다른 접근을 선보인다. 책의 출발점이기에 저자도 책 초반에 ‘스핑크스의 수수께끼’ 비유까지 들어가며 퍼스와 다른 기호학이 어떻게 다른지 열심히 설명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내가 이렇게 생겨먹은 거 자체가 하나의 기호다. 내가 제 아무리 야한 생각 한번 하지 않은 순결 100%의 20대 남자라 해도, 원래 쑥스러움이 많아서 말이 별로 많지 않아도, 남보다 그저 키와 덩치가 조금 더 클 뿐이라도, 지나가는 여자에겐 무섭고 위협적이며 폭력적인 고릴라 1호일 수 있다.
내가 이렇게 생겨 먹은 거 자체가 하나의 기호로 작동한다는 건 눈 코 입이 요렇게 생겨 붙은 유인원의 진화 과정과 인종적, 가족적 유전에다 한국사회의 남녀 사이 거리에 따른 문화적 맥락, ‘해석체’로서 해당 여성의 개인적 기억과 경험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다 개입한다. 이게 세미오시스, 곧 기호작용이다. 기표와 기의로 짜여진 구조물에 비해 훨씬 다차원적이며 역동적이다. 당연히 적용 범위도 넓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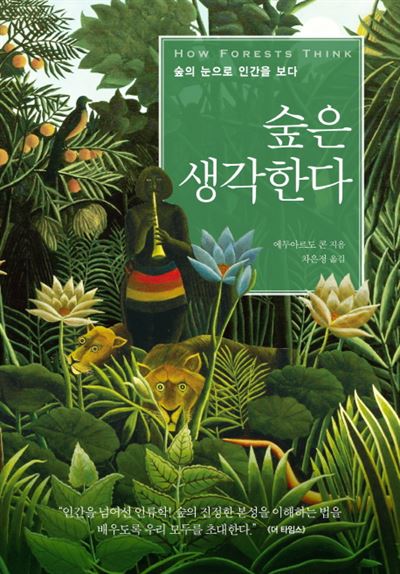
숲은 생각한다
에두아르도 콘 지음ㆍ차은정 옮김
사월의책 발행ㆍ456쪽ㆍ2만3,000원
기호와 기호작용을 이리 정의하면, 숲도 정말 생각한다. 가령 저자는 엎드려 자려다 원주민에게 경고받았다. 그런 행동은 재규어에게 ‘난 먹잇감’이란 신호라는 것이다. 잘 땐 바로 누워 자야 하고, 재규어가 접근해왔을 때는 누운 채로 고개를 들어 눈을 맞출 수 있어야 ‘난 고깃감이 아니라 너와 동등한 포식자야’라는 의미가 재규어에게 전달된다. 사람들처럼 말로 대화하는 건 아니지만, 숲이란 공간 안에서 사람과 재규어는 그렇게 서로 대화한다.
이렇게 따지면 대나무벌레가 생존을 위해 마른 나뭇가지와 닮은 꼴로 진화해나간 것은 자신을 잡아먹는 새와 대화를 한 결과다. 개미핥기가 개미를 핥아먹는 방식 또한 하나의 기호다. 아마존의 밀림 숲이란, 문명을 가진 인간이 개입하기 이전에 무의미하게 텅 비어 있는 공간이 아니라, 존재하는 순간부터 이미 숱하게 많은 기호들을 주고받은 의미가 넘치는 공간이다.
예상할 수 있듯 저자의 초점은 “한 손에는 사회문화적으로 구축된 인간 특유의 현실들이 있고 다른 한 손에는 우리 너머에 존재하는 객관적인 질료가 있다”는 식으로 설정하는, 인간과 자연간 이항대립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나라는 존재는, 나 주변의 나와 비슷한 인간뿐 아니라 그 외 수없이 많은 다른 동식물 존재들과 끊임없이 기호를 주고받은 존재라는 깨달음이다. “인류세 시대에서 살아남고자 한다면, 우리는 숲과 함께 그리고 숲처럼 생각하는 이 방식들을 적극적으로 갈고 닦아야 할 것”이라 주문한다. 퍼스의 기호학을 좇아 온, 인간을 넘어 숲으로 상징되는 자연으로까지 시선을 확대한 인류학은, 그래서 의외의 깨달음과 책임감을 만난다. 우리 존재가 그렇다.
조태성 기자 amorfat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