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와 가까운 거리에 소주란 곳이 있다. 지난 시절 항주와 더불어 하늘 위 천당에 비견되던 아름답고 풍요로운 고장이다. 거기에는 호구라 불리는 야트막한 언덕이 있다. 해발 34m 남짓한 크기다. 그런데 이곳이 그 일대의 이름난 ‘높은 산’ 노릇을 해왔다. 어찌된 일일까.
이미 공자 때부터 중국에선 사회 지도층이라면 모름지기 “등고(登高)”, 곧 높은 곳에 올라 글을 지을 줄 알아야 한다는 전통이 강하게 형성되어 왔다. 맹자는 이를 자기 식으로 변용하여 높은 곳에 올라 호연지기를 길러야 한다고 했다. 하여 삶터에 높은 산이 없으면 누각이나 탑이라도 우뚝 지어 높이를 확보하고, 그 높이서 사방을 일람함으로써 야기되는 회포를 시문에 담아내곤 했다.
언덕 생김새가 호랑이가 웅크리고 있는 형상이라는 호구도 그러했다. 어디서든 쉬이 접할 수 있는 자그마한 언덕임에도, 주변 일대가 지평선이 보이는 드넓은 평지다보니 1,000년이 넘는 성상 동안 높은 곳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정상에 45m 가량의 탑을 쌓아 높이를 한층 보완했지만, 호구만으로도 명소가 되기엔 부족함이 없었다. 대대로 많은 시인묵객들이 이곳을 찾았고, 호구는 그들이 읊은 시와 문장으로 명성의 높이가 전 중원을 덮었다.
그렇게 호구는 등고의 명소를 넘어 문학의 성지가 됐다. 비단 그곳뿐만이 아니었다. 넓디넓은 중국의 이곳저곳에는 문학 성지라 불릴 만한 곳이 연신 등장했다. 공자가 정상에 올라 천하 뭇 산의 작음을 실감했다는 태산을 비롯하여, 하늘과 땅이 다 떠 있는 듯 넓다고 노래된 동정호변의 악양루, 한과 당 제국의 도읍이었던 장안을 굽어보던 서안의 대안탑 등등, 중원 곳곳에 문학의 성지가 들어섰다. 그리고 문인들은 그 곳을 찾아 켜켜이 쌓여 있는 선배들의 시문에 자기 시문을 더하고 또 더했다.
지금 감각으로는 그다지 와 닿지 않은 현상일 수 있다. 별다른 감흥도 없고 그럴 필요도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당시로서는 사뭇 중요하고 의미 깊은 일이었다. 하루하루 살기 팍팍한 이들조차 문학의 성지를 찾아 길을 나섰다. 그들이 길을 떠난다는 건 또 다른 고통의 연속일 뿐 결코 즐김의 길일 수 없었다. 그럼에도 적지 않은 불우한 문인들이 길을 나섰고 문학의 성지에 자기 글을 보탰다. 내 글이 이 문학 성지를 대표하는 최고가 됐으면 하는 심정으로 말이다.
우리네 사람은 미래를 알지 못하는 존재다. 신이 아니기에 모르면 불안에 휩싸이는 존재이기도 하다. 그래서 논자들은, 인류는 불안의 해소라는 지향을 본능적으로 지닐 수밖에 없다고 한다. 불안을 해소하는 방도를 치열하게 모색하게 된 이유다. 가령 서구에서는 초월적이고 전지전능한 신을 섬기고 그에 귀의함으로써 이를 해소하고자 했다. 반면 한자권에는 그러한 초월적 절대자가 없었다. 대신 자연을 닮고자 했다. 태어나 자라다가 때가 되면 쇠락하고 결국엔 죽지만 주기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자연, 그러한 자연의 섭리에 나를 동화시키면 미지의 미래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았다.
역사의 흐름에 나를 참여시킴으로써, 달리 말해 내가 역사의 일부가 되게 함도 그에 못지않게 선호된 방도였다. 역사가 미래를 비춰주는 거울이기에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 역사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원료이자 원리이기 때문만도 아니었다. 당시 사람들은 미래가 눈앞의 현실과 함께 이미 역사에 들어와 있다고 믿었다. 현재와 미래가 역사라는 줄기찬 흐름 안에 통합되어 있기에 역사의 흐름에 내 삶을 담그면, 미래는 너끈히 예측 가능한 대상이 되어 미지로 인한 불안에서 헤어날 수 있다고 여겼다.
문학의 성지를 찾아가는 길은, 또 거기에 나의 시와 글을 더함은 문학의 성지를 둘러싸고 형성되어온, 또 도도하게 흘러온 역사에 나를 참여시키는 대표적 방식이었다. 천하가 지속되는 한 문학의 성지도 지속될 것이고, 그러면 그 곳을 둘러싼 역사도 계속 미래로 흘러들어갈 것이다. 내가 그렇게 미래에도 지속될 역사의 일부가 된다면 내 삶이 미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곧 나는 문학의 성지가 존속되는 한 미래에도 역사 속에서 계속 존재하게 된다. 문학의 성지를 매개로 형성된 역사의 흐름에 자신을 담고자 그리도 애썼던 까닭이다.
그래서 문학의 성지를 찾고 글을 쓰는 행위는 역사로의 순례였다. 종교적 순례가 절대자에게 나를 맡기는 여정이요, 이를 통해 원초적 불안을 해소하는 과정이었듯이 역사로의 순례도 그러했다. 태산으로, 또 호구로 가는 길 내내 선인들이 그곳에 쌓아놓은 시문을 되뇌면서 살아 흐르는 역사와 접속했고, 신이 아니기에 지닐 수밖에 없는 원초적 불안을 그렇게 해소했다. 역사에 나를 맡김으로써 내 삶을 지탱해주는 터전을 일궈냈음이다.
그런 문학의 성지가 중국에만 있었음은 아니다. 백두산이나 금강산 등은 우리의 대표적 문학 성지다. 적잖은 이들이 그곳으로 역사의 순례를 다녀왔다. 물론 분단으로 그 순례의 길은 끊겼다. 그렇다고 그곳을 둘러싼 역사마저 끊겼음은 아니다.
김월회 서울대 중어중문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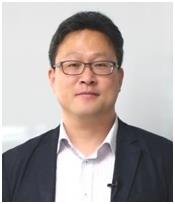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